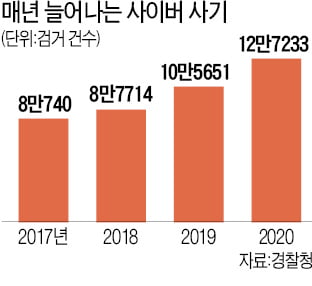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목적을 속인 후 다른 곳에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년 새 감소 추이였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13건에서 2018년에는 707건으로 급증했으나 2019년 629건, 2020년 486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11월까지 603건을 기록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처럼 외국환은행이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송금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정해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쪼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당국에 적발된 C씨는 3개월간 4880회에 걸쳐 1445만달러를, D씨는 10개월간 1755회에 걸쳐 524만 달러를 각각 해외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국은 송금 시점과 내용을 감안해 사실상 ‘단일 송금’으로 인정된다면 자본 거래 미신고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 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