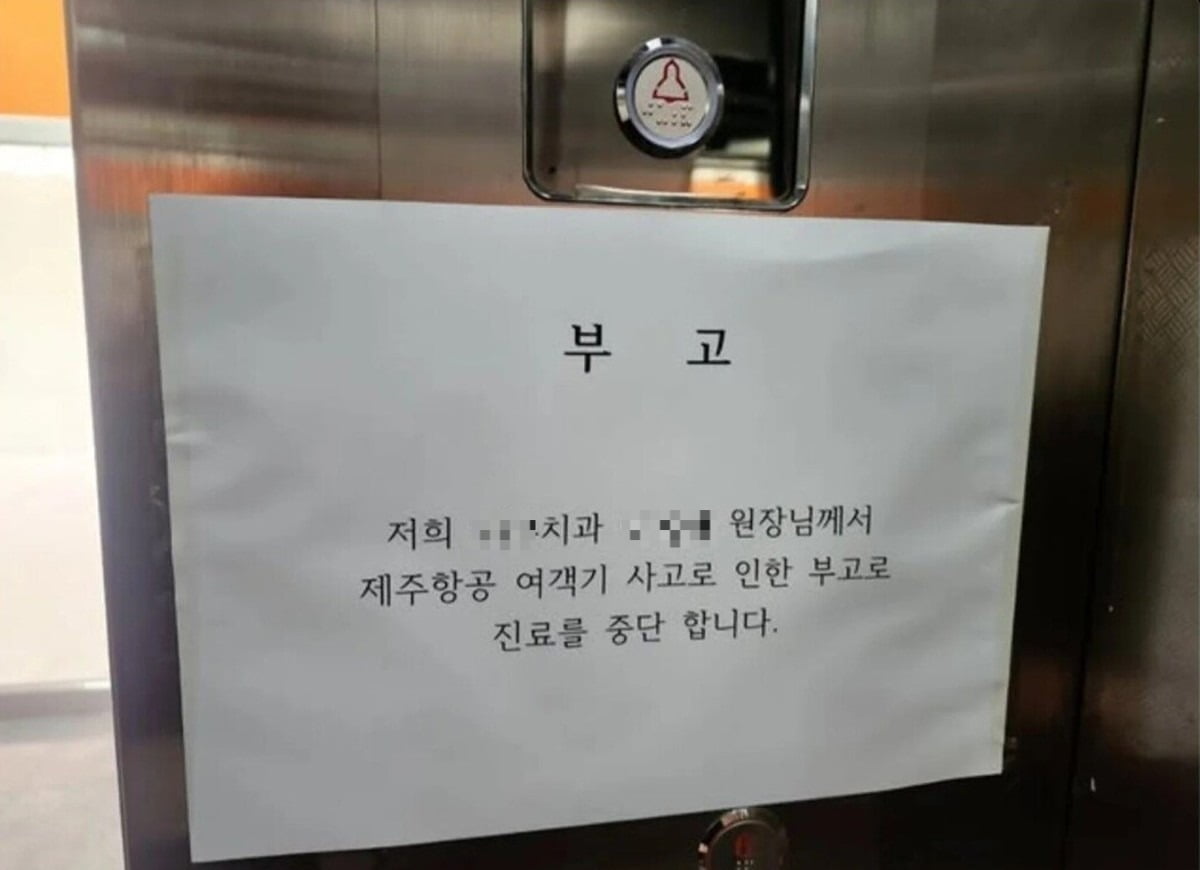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
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
미제스에서 시작해 하이에크를 거쳐 계승, 발전되어 온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황은 과도한 돈 풀기와 인위적인 저금리로 만들어진 호황이 붕괴하는 과정이다. 중앙은행의 통화 확장과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신용창조로 인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면, 그에 따른 과잉 투자 과소비가 일어난다. 호황 국면의 연출이다.그러나 과잉 투자 과소비가 생산요소 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결국 통화량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통화량 축소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과잉 투자 실패에 따른 여신 회수 불능의 위험 탓에 신용을 축소하게 된다. 바로 이때 불황이 시작된다는 게 경기변동이론의 핵심 논지다.
지난 25일 연임에 성공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1개월 동안 줄곧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대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올라 모두를 당황케 하고 있다. 1990년 11월 이후 연간 기준 최고 상승이며, 6개월 연속 5%가 넘는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도 0.9% 올라 지금이 명백한 물가상승 구간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임기를 맞은 파월 의장에게 주어진 임무는 현상 유지일 가능성이 크다. 지나치게 매파적인 행동으로 시장을 놀래 켜도 안되고 지나치게 비둘기파적인 행동으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켜도 안 된다. 바꿔 말하면,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비용을 펑펑 쓸 수 있게 조력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재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정부와 국민 중 어느 쪽의 심기도 심하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말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을 두고 중앙은행과 시장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도 무분별한 신용 팽창과 물가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풍선이 터지기를 기다리며 계속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지어지면 위기가 온다?
우리는 불황이 임박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하철에 타서 자리에 앉았는데 양옆 사람이 모두 코인 차트를 보고 있는 경우, 생전 연락도 없던 친척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처음 듣는 코인 이름을 대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경우, 갑자기 기업들의 IPO가 줄을 잇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신호가 있다. 만약 그보다 좀 더 실증적인 것을 찾는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경제학 이론에 주목해 볼 만 하다.2004년, 중동의 두바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건물 높이, 층간 높이, 층 개수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최다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했다. 건물의 이름은 부르즈 두바이(Burj Dubai)로 불렸다.

그는 이 글에서 기존 건물들의 기록을 경신하는 초고층 빌딩이 완공되기 직전에는 언제나 경기침체나 주식시장 폭락이 먼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살펴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호황 국면의 끝에는 값싸게 조달한 돈이 시장에 넘쳐흘러 과잉 투자가 폭증하는데, 기업이 저지르는 과잉 투자의 끝판왕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초고층 빌딩이 지어지기 전에는 경제 위기가 있었을까? 1909년 뉴욕 맨해튼에 지어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사 타워는 1913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이 건물이 완공되기 2년 전인 1907년에는 시중 은행들과 신탁사들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며 뉴욕 주가지수가 50%까지 폭락한 1907년 은행 패닉 사건이 있었다.
지금도 뉴욕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크라이슬러 빌딩은 1930년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10년간 불황의 늪으로 끌고 갔던 대공황은 검은 화요일로 불리는 1929년 10월 29일,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의 폭락과 함께 시작되었다.
앞서 소개한 부르즈 두바이가 2007년에 완공된 다음 해인 2008년에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뉴욕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다. (참고로 2007년 완공된 부르즈 두바이는 2010년 부르즈 할리파로 이름을 변경하여 전격 개장했다). 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 공짜 돈, 미래에 대한 낙관, 그리고 탐욕이 넘치는 경기 호황의 말미가 되면 기업들은 앞다투어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 그 꼭대기에 자신들의 로고를 박고 싶은 모양이다.
디지털 세상의 딜레마
사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고마워해야 한다. 만약 암호화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밀어 올렸을 테니 말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약 20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해준 덕분에 지금까지 거품 붕괴와 불황은 찾아오지 않았다.그러나 무엇이든 끝은 있는 법이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다. 우리가 모두 2017년 끝에 ICO 거품 붕괴를 통해 목격했듯,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도 허황한 꿈과 탐욕으로 얼룩진 과잉 투자가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세상의 거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연 무엇이 디지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탐욕의 절정일까?
14억 원에 팔린 원숭이 그림 NFT일 수도 있고, 역대 가장 비싼 금액을 주고 산 NBA 농구팀의 LA 홈구장 이름 판권일 수도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가격이 10배나 뛴 이름만 똑같은 오미크론 디파이 토큰일 수도 있다. 무엇이 위기의 전조인지 더욱 불분명해진 디지털 세상에서 근거없는 낙관은 독이다. 언제 등 뒤로 다가와 칼을 찌를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 우리는 더욱 기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백훈종 샌드뱅크 COO는…
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