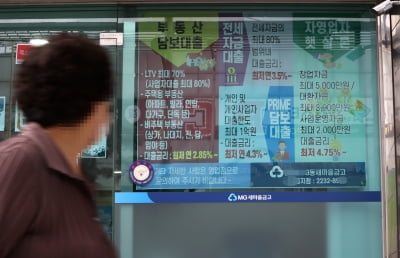인적 드문 거리에 ‘상가 임대’ 현수막만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 47.2%
2곳 중 1곳이 문 닫은 꼴
"권리금 안받겠다"는데도 점포 정리 힘들어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명동 상권의 유명 가게들이 문을 닫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라워하는 시민들 반응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분위기를 감안해도 거리는 한산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붐비는 곳이었지만 이젠 상가마다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곳곳에 나붙은 ‘폐업·임대’ 안내문
대한민국에서 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자 서울 최대 상권인 명동의 현주소다.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매년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활기가 넘쳤지만 이젠 곳곳에 '폐업' 또는 '임대' 안내문만 붙어있어 을씨년스러운 느낌마저 주는 거리가 됐다.
그나마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 상점은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정오가 돼도 여전히 문 닫힌 점포가 대다수였다. 손님이 끊긴 상황에 일찍 가게 문을 열어 공치느니 오후 늦게 영업을 시작해 전기료라도 아끼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들은 이미 명동을 빠져나갔다. 올해 삼성물산 패션부문 SPA브랜드 에잇세컨즈의 명동본점이 문을 닫았고,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의 국내 1호 매장 명동눈스퀘어점도 지난해 11월 셔터를 내렸다. 유니클로의 간판 매장이었던 명동중앙점도 올 1월 폐점했다. 이외에도 에이랜드, 후아유, 게스 등 명동에 자리잡았던 굵직한 패션 매장들이 모두 사라졌다.
명동 가게 2곳 중 1곳 문 닫아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명동 상가의 절반가량이 공실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47.2%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4.3%)와 비교하면 무려 열 배가 넘는다.상가 임대료 역시 대폭 떨어졌다. 명동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당 19만9700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30.1% 감소했다.
지표상 나타나는 공실률은 가게 두 곳 중 한 곳 꼴로 문 닫는 수준이었지만 현장 체감은 더욱 심각했다. 메인 거리는 그나마 형편이 나았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서면 한 골목 전체 가게가 줄줄이 폐점한 곳도 있었다.
명동 인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 일대 점포는 권리금 수억원씩 줘야 가게를 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른바 '무 권리 점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업종도 화장품·의류업부터 음식점·카페 등 다양하다.
통상 무권리금 매물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일종의 '마지막 카드'다. 답답한 마음에 보증금이라도 서둘러 받기 위해 권리금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계약이 1~2년 남았음에도 서둘러 점포를 처분하려는 수요까지 겹쳐 매물 소화가 더 어렵다고 했다.

명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양모 대표는 "요즘은 하도 공실이 늘어나니 월세를 10분의 1까지 줄여주거나 아예 1~2년간 받지 않겠다는 건물주도 있다. 그렇게 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한 상권이 살아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명동 거리를 찾는 이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는 분위기다. 인근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점심을 먹으러 잠시 명동에 들렀다는 강모 씨(44)는 "10년 만에 명동을 와 봤는데 사람이 많아 떠밀려 걷던 거리가 너무 한산해 놀랐다"며 "추억 속 가게들이 전부 사라져 안타깝다. 상권이 힘든 게 와 닿는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