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 2위 케이옥션, 내년 1월 코스닥 상장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신고서 제출…내달 공모
1위 서울옥션 추격 '시동'
1위 서울옥션 추격 '시동'
국내 양대 미술품 경매사인 케이옥션이 내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미술품 경매시장 ‘만년 2위’인 케이옥션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기반으로 1위인 서울옥션을 추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케이옥션은 15일 금융감독원에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60만 주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희망 공모가격은 1만7000~2만원으로 제시했다. 공모 규모는 272억~320억원이며 다음달 6~7일 수요예측, 12~13일 청약을 거쳐 다음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지난 수년간 증시 상장을 준비해온 케이옥션이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낸 건 올해 국내 미술시장의 ‘역대급 호황’ 덕분이다. 올해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는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낙찰총액은 3070억원으로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지난해(1153억원)는 물론 2018년 세운 기존 최고 기록(2194억원)을 한참 뛰어넘었다. 이 기간 케이옥션의 낙찰총액도 1200억원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술시장에서는 이번 IPO로 향후 미술품 경매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옥션은 가나아트가 1998년 설립했고, 케이옥션은 갤러리현대가 2005년 세웠다. 이후 두 회사는 오랫동안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해왔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점유율은 서울옥션이 48%, 케이옥션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미술 경매시장을 양분하는 셈이다. 온라인 경매 규모에서는 지금도 케이옥션이 서울옥션을 대체로 앞서고 있다.
IPO로 당장 시장 판도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옥션은 2008년 코스닥시장에 일찌감치 상장했다. 올해 초 7000원대였던 주가는 최근 3만원 안팎까지 4배가량 뛰었고, 시가총액은 5000억원에 육박한다. 케이옥션이 밝힌 상장 직후 예상 시총(1515억~1782억원)의 3배에 달한다. 두 회사의 오프라인 경매에서도 서울옥션 쪽에 고가 작품이 더 많은 사례가 적지 않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케이옥션은 15일 금융감독원에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60만 주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희망 공모가격은 1만7000~2만원으로 제시했다. 공모 규모는 272억~320억원이며 다음달 6~7일 수요예측, 12~13일 청약을 거쳐 다음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지난 수년간 증시 상장을 준비해온 케이옥션이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낸 건 올해 국내 미술시장의 ‘역대급 호황’ 덕분이다. 올해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는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낙찰총액은 3070억원으로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지난해(1153억원)는 물론 2018년 세운 기존 최고 기록(2194억원)을 한참 뛰어넘었다. 이 기간 케이옥션의 낙찰총액도 1200억원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술시장에서는 이번 IPO로 향후 미술품 경매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옥션은 가나아트가 1998년 설립했고, 케이옥션은 갤러리현대가 2005년 세웠다. 이후 두 회사는 오랫동안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해왔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점유율은 서울옥션이 48%, 케이옥션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미술 경매시장을 양분하는 셈이다. 온라인 경매 규모에서는 지금도 케이옥션이 서울옥션을 대체로 앞서고 있다.
IPO로 당장 시장 판도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옥션은 2008년 코스닥시장에 일찌감치 상장했다. 올해 초 7000원대였던 주가는 최근 3만원 안팎까지 4배가량 뛰었고, 시가총액은 5000억원에 육박한다. 케이옥션이 밝힌 상장 직후 예상 시총(1515억~1782억원)의 3배에 달한다. 두 회사의 오프라인 경매에서도 서울옥션 쪽에 고가 작품이 더 많은 사례가 적지 않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마하트마 간디가 썼던 안경, 英 경매에 나온다…예상 가격은? [박상용의 별난세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1727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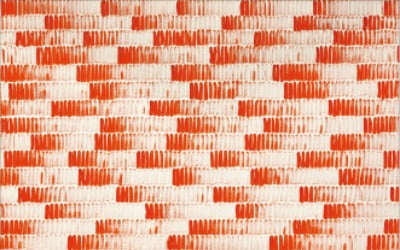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