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를 인지적·감정적·수용적으로 만들어 뇌가 배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코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왜’라고 묻기보다 ‘무엇’에 대해서 물으라는 것이다. 즉 ‘왜 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왜’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핑곗거리를 만들어내기에 급급하게 된다. 이유를 묻는 말에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도록 기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엇이라는 질문은 실제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가능하게 한다.
업무 환경을 즐겁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것도 뇌과학 측면에서 타당하다. 인간의 뇌 속엔 거울 뉴런이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표정이 활기차고 밝으면 직원들 표정도 대개 밝고 활기차다. 옆 동료가 신나게 일하는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다. 저자가 뇌과학자가 아닌 만큼 전문적으로 뇌과학을 파고들진 않지만 뇌과학을 경영 일선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신선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살이 찌고 근력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다. 불안과 우울감이 커지고 집중력, 기억력, 기획력이 저하된다. 우리의 뇌가 약해지는 것이다. 핀란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수학 및 영어 시험 성적의 하락 사이에 눈에 띄는 연관성이 발견됐다. 다른 연구에선 차 안이나 TV 앞에 앉아 보낸 시간이 2~3시간 많은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 예리함이 훨씬 빨리 감소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자는 몰아서 하는 고강도 운동보다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가벼운 움직임이 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걷기, 달리기, 춤추기, 스트레칭 등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산책을 하면 머릿속이 가뿐해진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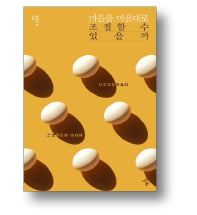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책마을] 많이 다른 '이웃 나라' 韓·中·日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28347820.3.jpg)
![[책꽂이] '슈퍼 석세스' 등](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28350609.3.jpg)
![[책마을] 익숙한 음식의 '낯선 얼굴'을 마주하는 재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A.283503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