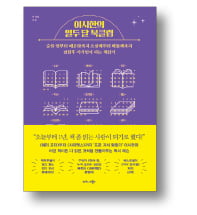
책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도 들려준다. 역주행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이 그런 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작가가 살아있을 땐 빛을 보지 못했다. 《모비 딕》을 쓴 허먼 멜빌 역시 부고 기사에 단지 ‘문단 활동을 했던 시민’이라고만 소개됐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당시 유명 작가이긴 했지만 《위대한 개츠비》는 지금처럼 널리 읽힌 책은 아니었고, 2차 세계대전 참전 미군을 위한 진중문고로 선정되면서 재조명을 받게됐다. 잘 쓰인 과학책은 인문학을 품고 있다고도 말한다. 단순히 과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시골을 떠나 서울로 유학갔던 그에게 책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 당시엔 헌책방이 많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털어 희귀 서적을 모으게 됐다고 한다. 한 번은 헌책방에 들어가 “정지용 시집 있어요? 임화의 현해탄 있어요?”라고 물었다가 쫓겨났다고 한다. 북으로 넘어간 작가의 책이라 금서였고, 종로경찰서 형사가 보낸 프락치로 오해받은 탓이었다. 저자는 책이 읽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종이 재질, 활자, 디자인, 제작 방식 등 책의 물성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 그래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시대에도 종이책의 운명은 영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자는 책 말미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지금의 사회적 기록은 온라인을 통해 생성되는데, 이를 누가 보존할 것인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기업에 맡겨 놓아도 될 것인가.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지금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주목! 이 책] 한국 현대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AA.28581473.3.jpg)
![[주목! 이 책] 송나라의 슬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AA.28581472.3.jpg)
![[주목! 이 책]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AA.285814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