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례한 中 올림픽이 일깨운 교훈
주요 2개국(G2)이라는 ‘강국(强國)’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은 힘이 센 나라와 격이 높은 나라가 꼭 같은 것은 아니라는 오랜 진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외국 선수단에 대한 과도한 방역 조치, 외신 보도에 대한 방해에 이어 쇼트트랙 경기에서 빚어진 노골적 편파 판정, ‘헐렁한 복장’을 트집 잡은 스키점프 선수들의 무더기 실격까지 상식 밖의 일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여기에 톈안먼 광장 출정식에서 중국 선수단이 “오로지 1등, 중국의 승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외치는 모습, 조공 행렬이 연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외빈 만찬, 중국 온라인상에서 분출되는 맹목적 국수주의, 위압적인 어조로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입장문은 중국이 올림픽을 중화민족의 우수함을 뽐내는 장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마저 키운다. 아리안족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는 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안하무인 중국의 태도는 우리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는 뜻깊은 질문을 던진다. 단지 힘이 세고,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 지도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또 한국은 과연 중국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의문도 떠올리게 한다.
흔히 선진국의 기준으로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을 꼽는다. 경제력 측면에서 명목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 1인당 GDP 3만1631달러라는 한국의 지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BTS와 오징어게임으로 대변되는 ‘K컬처’도 어깨를 으쓱하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임을 자신할 수 있을지, 자신 있게 중국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점이 적지 않다. 통제와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중국식 사고는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잠복해 있다. 인류 보편의 가치에는 무심하다. 북한 인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한 비판은 찾기 힘들다. 홍콩의 민주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는 알아서 입을 닫았다. 감시국가 중국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선 중국의 무시와 하대를 피할 수 없다.
껍데기 아닌 알맹이가 바뀌어야
사회질서 측면에서도 갈 길이 멀다. 여전히 택시는 난폭운전을 하기 일쑤고, 건널목에선 보행자가 자동차 눈치를 봐야 한다. 지하철 승차장에선 숱하게 어깨를 부닥친다. 시끄럽고 염치없다고 깔보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과 얼마나 다를까 싶다.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후보 가족이 공무원을 개인 노비처럼 부려 먹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무속 논란이 이어지는 처지에선 전근대적 황제제도 같은 일당독재를 정색하고 지적하긴 힘들다.
위력을 과시한다고 지도국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중국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선진국은 절로 되는 게 아니다. 동계올림픽에서 빚어지는 중국의 만행을 거울삼아 우리도 살피고 고칠 점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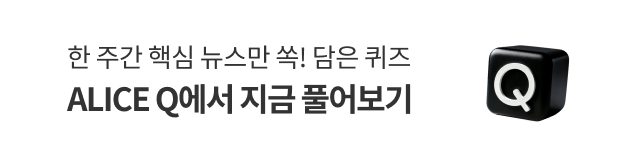

![[데스크 칼럼] '文정부 재정파탄 시즌2' 시작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14286610.3.jpg)
![[데스크 칼럼] 민주당 쇄신, 말보다 행동이 중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14477123.3.jpg)
![[데스크 칼럼] 물적분할과 자본시장의 숙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1468078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