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은 자국산 전기차에 퍼주는데…한국만 '보조금 축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은 21일 발간한 산업 동향 자료에서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내 신산업 육성 도구로 활용할 이유는 충분하다"면서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내수 판매가 늘면 생산단가가 줄어 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부품·인프라 등 연관 산업 성장도 동반된다.
일본, 중국, 독일 등 자동차 주요국이 일찌감치 자국산 전기차 중심으로 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자국산 차량의 기술적 특성에 유리한 정책 설계로 기술 경쟁력 제고는 물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기준(차값 30만 위안 이하)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교환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배경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의 경우 '외부 급전 기능'이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식으로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외부 급전 기능은 지진, 해일 등 재난발생 시 전기차를 비상전력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주로 일본산 전기차에 장착된다. 해당 기능이 없는 수입 전기차보다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20만엔(한화 약 207만원) 더 높게 책정됐다.
독일은 자국 기업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차에 다른 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국 기업이 주로 저렴한 가격의 소형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고가 수입 전기차 판매를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도리어 대당 전기차 보조금 액수를 줄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당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급액이 줄면 판매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능보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점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직접 힘을 싣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기로 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축소로 최대 300만원까지 액수가 줄어든 곳도 있다.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역시 지난해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500만원 줄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보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호중 한자연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특정 국가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국제 규범상 어렵지만, 자국산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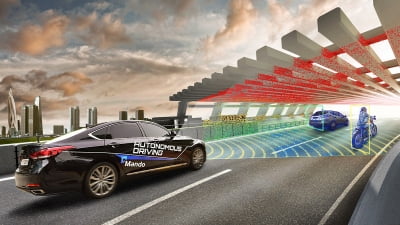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