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이번엔 '틈새 투기' 막을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건축 길잡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틈새 투기’를 방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6㎡ 초과 토지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즉 대지 지분이 6㎡를 넘는 원룸이나 초소형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초소형 매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 등 택지 공급 시 토지거래 제한 용도로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은마아파트’가 있는 강남구 대치동은 2020년 ‘6·17 대책’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몰린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용산구 청파2구역 등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에 선정된 21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한 채 거래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에서는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지만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기 때문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1978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 등 택지 공급 시 토지거래 제한 용도로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은마아파트’가 있는 강남구 대치동은 2020년 ‘6·17 대책’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몰린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용산구 청파2구역 등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에 선정된 21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한 채 거래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에서는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지만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기 때문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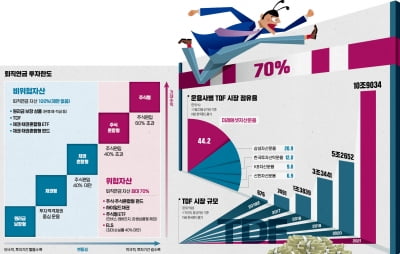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