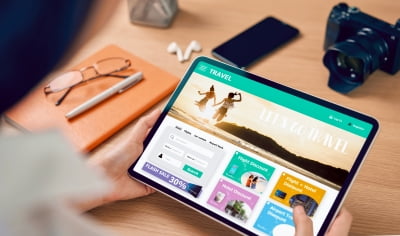이런 프리미엄 소주 시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성장 중이었다. 2019년 300억~4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700억원 시장으로도 본다. 대표적으로 화요, 일품진로를 선두로 안동소주, 이강주, 문배주, 고소리술 등 정통파 전통주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복순도가, 양촌 양조, 천비향, 진맥 소주, 스마트브루어리 등 지역 특산주 업체에 이제는 오미자, 감귤 등으로 증류주를 만드는 오미나라, 제주 시트러스 등에서 개성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너무 즐겁다. 늘 같은 소주만 고르다가 선택지가 다양해짐으로써 고르는 재미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프리미엄 소주는 기존의 소주와 뭐가 다른 것일까?
일단 원재료가 확실하다. 기존의 소주는 타피오카 및 잉여 농산물을 중심으로 발효 후 증류를 진행한다. 이런 재료로 순도 95%의 알코올을 만들어 낸다. 이 순도 95%의 알코올에 물을 넣고 조미료를 넣으면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그 소주들이 탄생한다. 정해진 원료가 아니다 보니 원재료의 맛을 살리면 제품마다 맛이 달라진다. 그래서 맛과 향이 제거돼 있다. 지역별로 소주 맛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는 거의 조미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만큼 원재료명에 기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색, 무취, 무미에 가까운 맛을 낸다. 조미료, 물, 그리고 알코올 맛을 제외하면 무(無)맛인 것이다.
프리미엄 소주는 이것과 결을 달리한다. 원재료가 확실하다. 쌀, 보리, 수수, 고구마, 감자에 오미자, 감귤, 포도 등 과실류도 가세했다. 이렇게 확실한 원재료로 발효하고, 증류하는 모든 과정을 대부분 한 양조장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프리미엄 소주는 원재료의 풍미가 담겨 있다. 다만 증류라는 기법을 통해 기체로 올라온 만큼 향에 그 맛이 집중돼 있다. 그리고 마시고 난 이후에 후미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있다. 여기에 일반 소주는 숙성 없이 바로 출고되는데 프리미엄 소주는 길면 수년, 짧으면 몇 개월이라도 숙성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공간의 맛을 담았다고도 볼 수 있다. 향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기존 소주는 원재료의 풍미가 없는 술, 프리미엄 소주는 그 반대의 위치에 있다. 원재료의 풍미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백색의 도화지 같은 느낌으로 모든 음식에 적절히 맞출 수 있다. 반대로 프리미엄 소주는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밀한 음식과의 매칭이 필요하다.
프리미엄 소주 시장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 전체 시장의 2%에도 못 미친다. 이 원인은 주세법 체계에 있다. 용량이 아니라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재료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구조를 만든 것이다. 부가가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면 세금이 높아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구조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에 가장 보수적인 기업들이 주류 기업이었다. 개발을 하면 할수록 주세가 오르는 구조 탓이다. 하지만 이제 술 시장이 달라져 가고 있다. 많이 마시는 문화가 아닌 음미하는 시장, 즉 가치를 생각하는 소비 시장이 술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산물이 원료인 프리미엄 소주 시장의 확장은 변화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장이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는 소주의 주세법 체계를 종량세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남의 나라 재료로 빚는 술을 한국 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래야 우리 술의 정체성도 확립되고, 수출도 뻗어 나갈 수 있다. 술 산업은 농업이 근간이기 때문이다.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