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시간 북촌에 거주하며 많은 미술가의 이야기를 접했던 저자는 근대 미술가들의 고달팠지만 아름다웠던 삶을 책에 담아냈다. 북촌을 산책하며 올라가는 길에선 서양화의 시작을 알린 춘곡 고희동을, 내려오는 길에선 임금의 초상을 그린 인물화의 귀재 이당 김은호를 만난다. 김은호가 거주하던 동네에는 기억상실증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비운의 화가 백윤문, 장애를 극복한 의지의 화가 김기창 등도 살았다.
서촌에도 많은 미술인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백악산 아래에서는 세상과 불화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표지화에 능했던 팔방미인 정현웅을 만날 수 있다. 수성동 아래 옥인동 주변에서는 박제가 된 천재 구본웅과 이상,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누상동에서 짧은 행복을 누린 이중섭, 불꽃처럼 살았던 ‘채색화의 전설’ 천경자의 발자취를 좇는다. 풍부한 사진 자료 덕분에 과거로 돌아간 듯 이들이 살았던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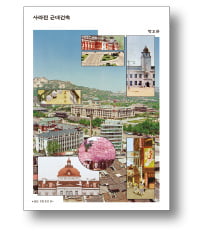
경복궁 서쪽 옥인동에는 송석원이란 서양식 건물이 있었다. 대한제국 말 친일파이던 윤덕영이 권력을 과시하려고 궁궐보다 더 호화스럽게 지었다. 이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됐는데, 1973년 도로정비사업으로 철거됐다. 반도호텔, 조선총독부, 조선신궁 등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이제 서울에서 일제의 흔적이 남은 건축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에서 근대 건축이 사라진 데는 전쟁도 한몫했다.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와 공습으로 서울의 많은 건축물이 파괴됐다. 책은 또 전후 서울 요새화 계획으로 급히 건설된 남산터널과 을지로 지하보도, 남산타워, 북악스카이웨이, 잠수교 등을 돌아본다. 여전히 남아 있는 전쟁의 상흔, 남과 북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분단의 현실을 일깨운다.

저자는 “생생한 근대사의 현장인 서울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이자 역사이며, 유기체처럼 꿈틀대며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곳”이라며 “누군가는 서울을 삭막하기 그지없는 곳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서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숱한 매력을 감추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책마을] 유전자 가위로 자르고 붙이니…"RNA 유레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9144483.3.jpg)
![[책마을] 곧 초고령화 사회…대한민국의 앞날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9143709.3.jpg)
![[책마을] 탄소 졸업 못한 기업에 미래란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914369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