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현 시인 "죽음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정서 담았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규현 첫 시집 '모든 나는…' 출간
2022 한경 신춘문예 당선자
6년 동안 쓴 시 45편 수록
죽음 많은 시대 애도의 마음 표현
"다양한 내 모습 모두 사랑받길
다음 시집엔 재건 이야기 쓸 것"
2022 한경 신춘문예 당선자
6년 동안 쓴 시 45편 수록
죽음 많은 시대 애도의 마음 표현
"다양한 내 모습 모두 사랑받길
다음 시집엔 재건 이야기 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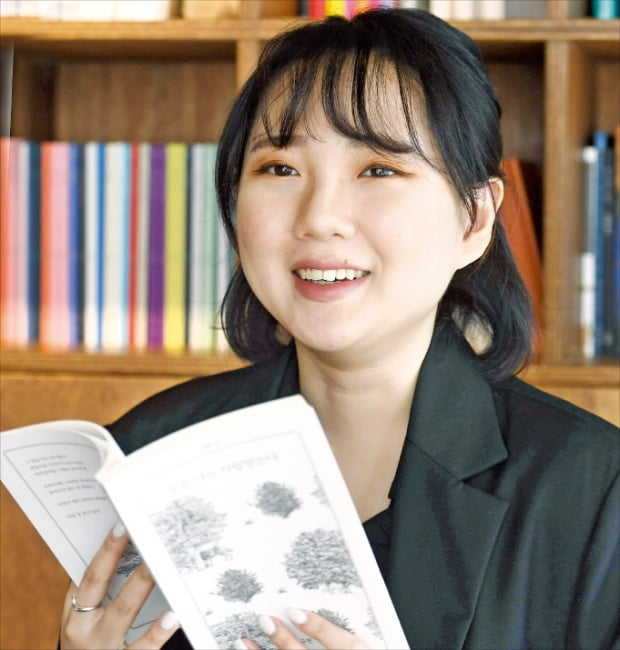
‘2022 한경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인 박규현 시인(26)이 첫 시집 《모든 나는 사랑받는다》(아침달)를 펴냈다. 서울 연남동 아침달 출판사에서 만난 박 시인은 “누구든 일상에서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라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각을 시로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시집엔 45편의 시가 담겼다. 그가 스무 살 때부터 6년 동안 쓴 시들이다. 반응이 좋아 벌써 2쇄에 들어갔다. 박 시인은 “얼떨떨하다”며 “그래도 여태까지 써온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으니 인생의 한 챕터를 매듭지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박 시인은 죽음의 정서를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로 썼다. ‘텅 빈 우주/텅 빈 휴게소//다 자라버렸고/다 살아버렸다//그게 꼭 서럽다는 건 아니어서/낮이나 밤이나 죽지 않기로 해’(‘아주 오래’ 중). 그의 시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낸다면 그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로, 각종 사고로, 혹은 삶에 대한 의지 상실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박 시인은 “어릴 때부터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친구들이 잇달아 세상을 뜨면서 죽음에 대한 시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시는 서울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아니. 서울에서 여자로 죽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안미츠와 성실하고 배고픈 친구들’ 중). 서울에서 나고 자란 여성 시인의 눈을 통해 보이는 서울은 화려하지만은 않다. 죽음 가득한 재난 현장인 동시에 그가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생활 공간이다.
시집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아주, 로쿄, 안미츠 씨 같은 인물들이다. 박 시인은 “차마 제 얼굴을 하고선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가면”이라며 “로쿄는 장난감이나 유령, 아주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 중년 여성인 안미츠 씨는 제가 바라는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시집 제목은 이렇게 제각기 다른 자신의 모습이 모두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에 사랑받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는 게 시인 자신일 수 있지만, 읽는 사람에게 와 닿는다면 모든 독자라고도 할 수 있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시를 쓰고 있는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시를 읽어줄 독자를 갈망했다. 수업 시간이나 동료들의 시선으로 읽히는 것을 넘어 온전히 독자의 시선에서 시가 읽히기를 바랐다. 독립 문예지에 작품을 계속 발표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다 등단하지 않은 시인의 시집도 내준다는 아침달 출판사를 알게 돼 원고를 투고했다고 한다. 반려되고 재투고하기를 반복하다 지난해 5월 출간 결정이 났다. “한경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바로 시집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몇 년 걸린 작업이에요.”
신춘문예 당선과 시집 출간이 겹치면서 생활이 조금 바빠졌다. 문예지에서 청탁받은 시를 쓰고 가끔 낭독회도 한다. 대학원은 잠시 휴학했다. 그동안 시를 잔뜩 써놓을 계획이다. “한 매듭을 지었으니 다음으로 나아가야죠. 이번 시집에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에 대해 다뤘으니 다음 시집에선 무너진 세계를 재건해 보려는 화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책마을] '대체 불가' 경쟁력이 일류 기업 만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9236753.3.jpg)
![[책마을] 현대 무용에 비친 전쟁의 광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9236099.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