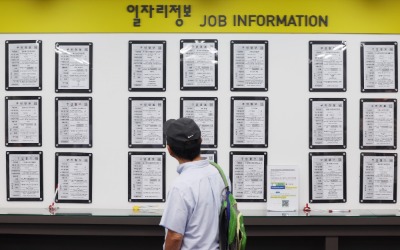부름켜는 나무 줄기의 물관과 체관 사이에 있다.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길이고, 체관은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줄기와 뿌리로 이동하는 길이다. 두 갈래 길 사이에 있는 부름켜는 나무의 성장과 생육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무와 달리 풀에는 부름켜가 없어 줄기가 가늘고 잘 휘어진다.
부름켜는 나무 안쪽에 목재를 만들고 바깥쪽에는 껍질을 만든다. 봄과 여름에는 세포분열이 활발한 까닭에 크고 연한 세포를 많이 생성한다. 식물호르몬 분비도 그만큼 왕성하다. 가을에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 세포가 작고 단단해진다. 이 두 세포층이 줄기 안에서 겹겹이 교차하며 매년 만들어내는 경계가 나이테(연륜)다.
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떨켜’를 준비하며 스스로 잎을 떨어뜨린다. 떨켜는 잎이 떨어진 자리에 생기는 세포층을 가리킨다. 떨켜 아래에는 보호막이 있어 외부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줄기의 수분이 잎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한다. 나무가 혹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떨켜를 통해 몸통을 지키고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잎이 지는 데도 차례가 있다. 성장호르몬 분비가 끝나는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돋아난 잎이 가장 늦게 떨어지고, 가장 늦게 돋은 잎이 제일 먼저 떨어진다. 오 헨리 소설 ‘마지막 잎새’는 지난봄 맨 먼저 나온 잎일 가능성이 높다.
나무는 이렇듯 봄여름에 부름켜로 성장을 촉진하고 열매를 준비하며, 가을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혹한을 견디도록 스스로 잎을 떨군다. 사람 사는 일과 국가 경영도 다르지 않다. 한창 생장하며 파이를 키워야 할 때와 구조조정으로 군살을 빼고 살아남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요즘처럼 나라 안팎 상황이 엄중한데 정치권은 밤낮없이 도끼질만 해댄다. 부름켜와 떨켜가 상처를 입으면 나무 전체가 위험해진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천자 칼럼] 1.3억짜리 셀프훈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A.29858778.3.jpg)
![[천자 칼럼] 한국 교수사회의 민낯](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A.29845889.3.jpg)
![[천자 칼럼] 차붐 넘어선 손흥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A.29833631.3.jpg)

![[단독] "손 꼭 잡고 다니던 부부"…알고보니 100억 사기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906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