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캠프너 지음
박세연 옮김 / 열린책들
456쪽│2만3000원
영국 저널리스트가 본 '독일의 강점'
유대인 기념비 찾아 사과한 서독 총리
통렬한 반성·굴욕을 성장 기회로 바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도 경제 원동력
"파업은 최후 수단…노사 상생으로 타협"

몇몇 대기업이 잘해서 독일 제조업이 세계 최강이 된 게 아니다. 독일은 중소기업 천국으로 불린다.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선정한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작지만 강한 기업)’ 2700곳 가운데 절반이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1·2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은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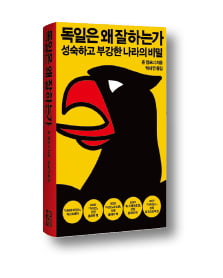
저자 존 캠프너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국제 평론가다. 옥스퍼드 퀸스칼리지에서 현대사와 러시아어를 전공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시기에 텔레그래프 기자로 활약했고 파이낸셜타임스와 BBC 기자를 거쳐 뉴스테이츠먼 편집장을 지냈다.
독일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규칙’이다. 저자는 새벽 4시에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관에게 벌금 딱지를 떼인 일화를 들려준다. 그러나 규칙에 대한 강박이 독일의 전부는 아니다.
책은 독일의 반성에 주목한다. 나치에 학살된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은 독일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정문과 의사당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다. 이 기념물은 관을 형상화한 2711개의 직사각형 콘크리트 평판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죽음과 국가의 폭력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가 그들 자신의 치부를 기념하는 구조물을 짓는다는 말인가? 그것도 가장 유명한 두 곳의 랜드마크 바로 옆에.”
처음부터 독일이 과거사를 정리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전쟁 직후 전범과 부역자의 상당수가 고위 관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독일 젊은이들은 ‘68혁명(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항의하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회변혁 운동)’을 계기로 역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1970년 바르샤바 게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통렬한 반성은 오히려 굴욕을 성장의 기회로 바꿨다. 바로 ‘질문하는 사람’을 길러낸 것이다. 독일 학교는 ‘시민의 용기’라는 개념을 반드시 가르친다.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럴 때도 법을 지키는 게 맞는가. 학생들 스스로 ‘이건 아니다’란 판단이 들면 용기 있게 국가에 저항해도 된다.”
책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서의 반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독일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적는다. 2015년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수용한 것을 두고 저자는 “독일이 보여준 최고의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왜 독일은 여러 우려 속에서도 난민을 환영했을까.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나치의) 범죄를 기억하는 것은 절대 끝나지 않을 의무”라며 “이런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독일의 정체성이자 독일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저자는 독일 경제 발전의 원동력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즉 ‘독일식 사회적 시장주의’에서 찾는다. 2014년 이후 독일 정부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재정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자본주의 안에서 최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고려한 게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됐다. 대기업 감사위원회 의석의 일부를 노동조합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에게 주도록 제도화한 게 대표적이다. 상생하는 노사 관계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독일에서 파업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다. 보통은 타협으로 끝이 난다”고 했다.
저자가 영국인이라는 것은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책의 상당 부분을 독일의 선전을 바라보는 영국인의 열패감으로 채운 것은 한국인 독자 입장에선 공감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독일이 잘한다’고 평가할 때 비교 대상을 영국으로 삼은 것도 아쉽다. 하지만 《독일은 왜 잘하는가》에 더해 ‘영국은 어쩌다 대영제국의 영예를 잃어버렸을까’란 책을 함께 읽는 셈 친다면 ‘영국인이 쓴 독일 책’이란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책마을] "메타버스 플랫폼, 10년내 유튜브 대체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A.29960920.3.jpg)
![[책마을] 한국을 '세계 3대 카페 시장' 만든 혁신가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A.2996091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