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첫 한국식 사찰…"우아한 단청 '한옥의 美' 알릴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계종 총무원장의 '35년 꿈'
부다가야에 '분황사' 준공
"불교성지 韓사찰 없어 부끄럽다"
35년 전 인도 순례 나선 원행스님
"언젠가 한국식 사찰 지어야" 다짐
목재 대신 콘크리트로 건설
보건소도 갖춰 '의료 사각' 해소
불교 4대 성지 '마하보디'와 인접
순례자에게 한국불교 전파 기대
부다가야에 '분황사' 준공
"불교성지 韓사찰 없어 부끄럽다"
35년 전 인도 순례 나선 원행스님
"언젠가 한국식 사찰 지어야" 다짐
목재 대신 콘크리트로 건설
보건소도 갖춰 '의료 사각' 해소
불교 4대 성지 '마하보디'와 인접
순례자에게 한국불교 전파 기대

35년 전 성지순례에 나선 젊은 승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건 인도 비하르주(州) 부다가야 지역에 다다랐을 때였다. 부다가야는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깨달음을 얻은 불교의 성지. 당시 이곳에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수많은 나라가 사찰을 짓고 수행과 사회공헌 활동을 했지만, 한국 사찰은 없었다. ‘우리도 동참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은 이후 오랫동안 젊은 스님의 머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2018년 한국 불교계를 지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된 원행 스님은 젊은 시절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곤 자신의 역점 사업 리스트에 ‘인도 최초의 한국 전통양식 사찰’인 분황사 건립을 담았고, 지난 21일 ‘35년 묵은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현실이 된 총무원장의 꿈

분황사 건립은 2019년 말 익명의 두 여성 불자(설매·연취 보살)가 조계종에 50억원을 기부하면서 본격화됐다. 사찰명을 제안한 설매 보살은 “분황은 푼다리카, 즉 흰 연꽃을 뜻한다”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이 흰 연꽃으로 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했다.

분황사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다. 대웅전, 수행관 등 불교 시설뿐 아니라 현지 주민을 위한 보건소도 갖출 계획이어서다. 분황사 건립을 주도한 부다팔라 스님은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인도에 보건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추후 의과대학을 설립해 현지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 당시 의료병을 파병한 인도에 은혜를 갚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 구현
분황사를 지으면서 조계종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의 미(美)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먼 이국 땅에서 한국 전통방식의 사찰을 건립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큰 장애물은 48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더위였다. 하늘을 날던 새가 탈진해 땅에 떨어질 정도였다고 한다.대웅전 건축을 총괄한 박철수 대목장(67)은 “폭염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2년 동안 현장을 지켜야 하는 극한의 임무였다”며 “어찌 될지 몰라 유서를 써놓고 일했다”고 했다. 그는 “나무로 만들면 인도 벌레들이 갉아먹기 때문에 기둥은 물론 추녀, 서까래, 공포 등을 전부 콘크리트로 지었다”며 “콘크리트로 한옥의 곡선미를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시행착오 끝에 정면에서 보면 학이 날아가는 것 같은 처마의 곡선을 그려냈다”고 말했다.
항공 규제로 인해 한국 안료를 들여오지 못한 단청팀은 현지 상점을 돌며 단청 재료를 찾아야 했다. 단청장으로 일한 이연수 금화불교미술원 대표(60)는 “콘크리트 건물은 목조에 비해 벽면이 많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불교 설화 그림을 최대한 많이 그려 넣었다”고 했다.
대웅전에 모신 본존불, 아난존자, 가섭존자 불상은 습기에 쉽게 뒤틀릴 수 있는 목불 대신 금동불을 택했다. 종단 자문 등을 거쳐 1년간 한국에서 조성해 부다가야로 옮겼다. 불상 조성을 담당한 이재윤 여진불교조각연구소 팀장(46)은 “형태가 변형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옻칠을 한 뒤 금박과 금분을 입혔다”며 “인도풍을 감안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적인 색채를 더 담아내기 위해 조선시대 불상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부다가야=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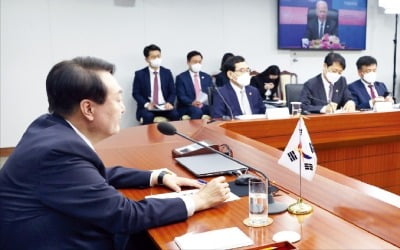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