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략) 내시가 복의(復衣·죽은 사람의 옷)를 받들고 동쪽 낙수받이에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 고복(皐復·죽은 사람의 넋을 부르는 것)했다.
"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임금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영조가 1776년 3월 5일 세상을 떠났을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세손인 정조가 곡하며 애도하자 신하와 내시들도 곡(哭)에 동참했다.
영조 사후 주검은 어떻게 다뤄지고, 왕릉에 묻히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을까.
500년 넘게 지속된 유교국가 조선의 국왕 장례에는 변화가 있었을까.
미술사학자인 장경희 한서대 교수는 신간 '국장과 왕릉'에서 조선왕실이 흉례 과정에서 왕의 시신을 처리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장례(喪葬禮)에 사용된 물품에 어떤 상징이 숨어 있는지 분석한다.
조선은 국왕이 승하하면 먼저 옷을 벗기고 목욕을 거행했다.
이후 상체에는 명의(明衣·염습할 때 가장 먼저 입히는 옷), 하체에는 치마를 걸쳤다.
저자는 굳어가는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지 대신 치마를 입혔다고 설명한다.
사후 5일까지는 초상(初喪)을 치렀다.
왕이 저승길에서 굶지 않도록 입 안에 밥을 넣고, 마지막에는 생전에 입던 옷 90벌로 시신을 덮거나 묶었다.
여름에는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관에 얼음을 채우기도 했다.
이어 바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지 않고, 5개월간 궁궐 빈전(殯殿·왕의 관을 모시던 전각)에 관(재궁)을 뒀다.
왕 시신이 있는 관은 이틀에 한 번씩 옻칠을 했다.
30회 넘게 옻칠하면 관 외부가 벽돌처럼 단단해지고, 시신의 부패 속도가 늦춰졌다.
저자는 "빈전이 유지되는 기간에 이뤄진 의례는 왕이 살아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설, 한식, 단오, 추석 등 절기마다 특별한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고 소개한다.
임금이 숨을 거두고 5개월이 지나면 궁을 떠나 무덤으로 향하는 인산(因山)이 진행됐다.
국장 행렬에는 군인, 상여꾼, 왕과 신료 등 1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고 한다.
상여는 800여 명이 4개 조로 나눠 교대로 맸다.
풍수에 따라 정한 명당에 조성된 왕릉은 지하 궁전처럼 꾸며졌다.
왕이 내세에서도 현세처럼 생활하기를 바라며 다양한 부장품을 넣기도 했다.
저자는 "왕의 죽음과 관련된 절차마다 독특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국왕의 죽음을 국왕다운 것으로 만들었다"며 "국장과 왕릉 조성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은 50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항상성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조선시대 국왕의 상장례 절차를 정리한 저자는 조선왕릉에 설치된 돌조각들도 살폈다.
그는 "왕실 문화의 시각적 상징물인 왕릉 석물(石物·돌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은 점차 커지다가 후기에 다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현암사. 384쪽. 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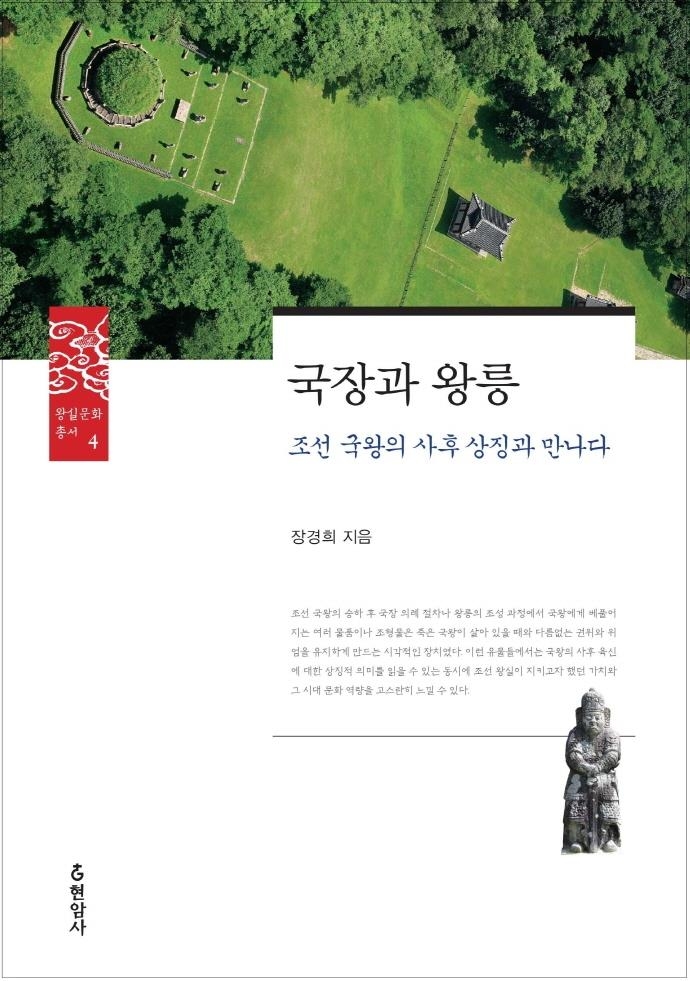
/연합뉴스


!['억대 대관료+α'…임영웅, 콘서트 취소 못한 이유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891332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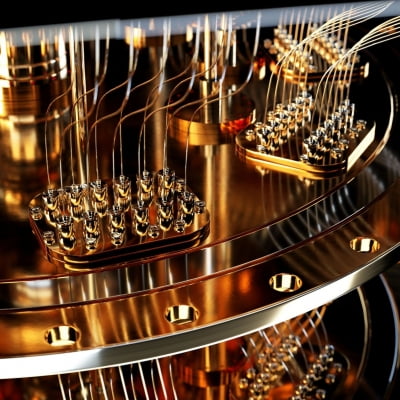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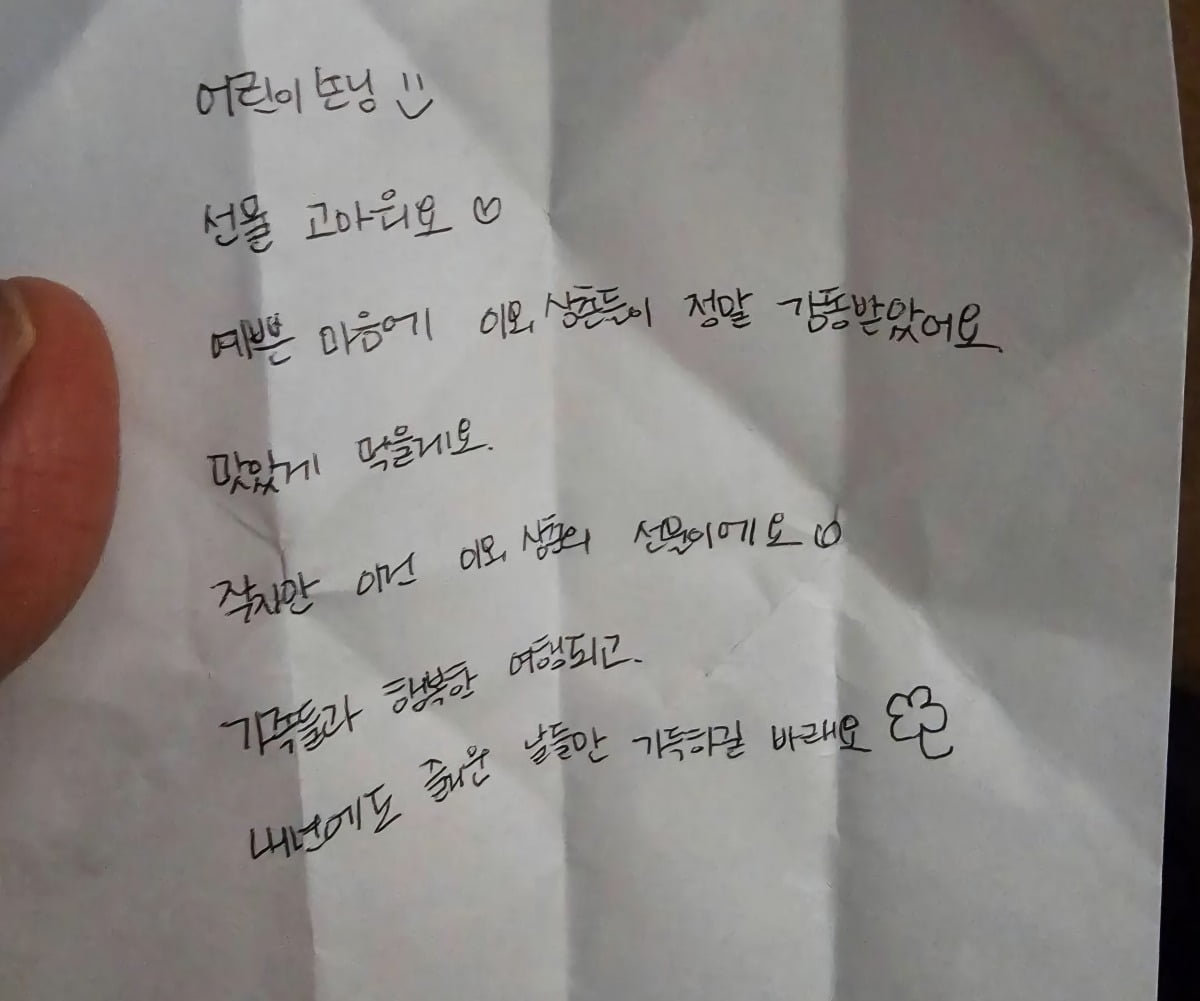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4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76437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