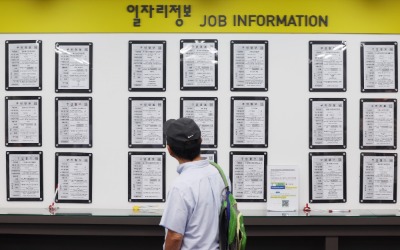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는 최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연구원 예레미 맥코르마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을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메갈로돈과 백상아리 이빨의 에나멜(법랑질)에 쌓인 아연의 안정 동위원소(66Zn) 값을 토대로 '영양단계(trophic level)'를 분석한 결과, 메갈로돈이 백상아리아와의 먹이경쟁에서 밀려 멸종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의 이빨에 축적되는 물질을 통해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영양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아질에 있는 유기 조직인 콜라젠의 질소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지만, 콜라젠이 오래 보존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아질을 덮고 있는 에나멜의 아연 동위원소를 활용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는 아연 동위원소 분석법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양 먹이사슬에서 위치를 파악할 때 아연 동위원솟값이 질소 동위원솟값과 작은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이후 연구팀은 메갈로돈과 백상아리의 아연 동위원소 값을 비교해 이들이 공존하던 플라이오세 초기에 각각 최상위 포식자로 영양단계가 겹친다는 점을 밝혔다.
두 종류의 상어가 해양 포유류를 놓고 먹이경쟁을 벌였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메갈로돈은 약 2300만전 전부터 360만년 전까지 살다 멸종했고, 다양한 멸종 원인이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메갈로돈의 멸종에는 기후나 환경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잠재적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백상아리와의 먹이경쟁이 멸종을 가져온 한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아연 동위원소를 이용해 수백만년 전 멸종한 동물의 먹이와 영양단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이 같은 방법은 인류의 조상을 포함한 다른 화석 동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단독] "손 꼭 잡고 다니던 부부"…알고보니 100억 사기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906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