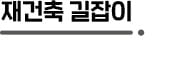저당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여야한다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저당 설정 당시에 축조 중이지만 아직 건물의 형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겠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1992.6.12. 선고 92다7221 판결【건물철거등】인데,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대지에 저당 설정할 당시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2층 주택 및 부속건물이 완공상태에 이른 사안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 후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지장물철거】은, 축조 중인 구조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92다7221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승계하면서도, 위 판결에 더하여 건축 중의 건물은 그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까지는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건축 중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완성하여 판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위 92다7221 판결은, 경매 당시까지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판시하지 못했다). 법정지상권제도가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법제에서 그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건물보존을 위하여 인정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에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따라, 건물신축공사 도중 터파기공사를 마치고 토사붕괴방지를 위하여 에이취빔(H-beam) 철골구조물만을 설치한 상태에서 낙찰될 때까지도 계속 공사가 중단된 이 사안에서는 법정지상권성립이 부정되었다.
그 후 선고된,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역시, 종전 판결들의 취지를 이어받아, 저당권설정일인 1997. 5. 23. 이전인 1997. 4. 초순경에 1층 바닥의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쳐지고, 1997. 6.경에는 벽체와 지붕공사가 완성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법정지상권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