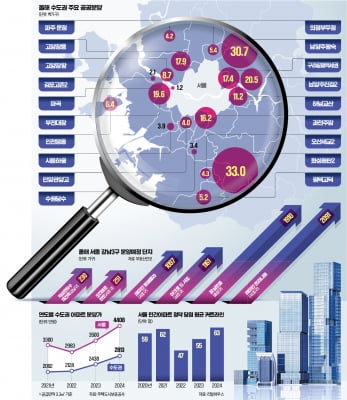B: “그래도 남의 집보다는 내 집이 낫지. 요즘 가격도 제법 빠졌고, 미분양이다 뭐다 매물도 많아 내 집 사기 좋은 때 아냐?”
A: “집 샀다가 가격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B: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듯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 그리고 설마 정부가 가격이 더 떨어지도록 놔두겠어?”
A: “나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추가 대책 내논답시고 주택가격만 오르면 집 사기 더 어려워질 거 아냐!”
B: “그래서 불안해.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전세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전세금 몽땅 올려달라고 할까봐서도 그렇고, 정부 대책이 또 나오게 되면 그나마 떨어지던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까봐 그래! 이참에 대출 끼고 아예 집 사는걸 생각해봐야겠어!”
A: “뭐 그렇다면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세가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면 맘 편하게 전세 살거나 임대주택 분양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집 값 떨어질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최근 저녁 약속이 있어 나갔다가 기다리는 사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내용이다. 곧장 지인이 오는 바람에 더 이상의 대화를 귀담아 들을 수 없었지만 이 짤막한 대화가 현 부동산시장을 대변하는 듯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해줬다.
위 대화의 주인공 A, B 두 명은 모두 무주택자인 듯하다. 그렇지만 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입장차는 분명했다. A는 내 집 마련에 다소 소극적인 무주택자, B는 내 집 마련에 다소 적극적인 무주택자!
[A는?] A는 침체돼있는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물론 향후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돈이 없어 집을 못사는지 아니면 돈이 있어도 집을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을 염려해 당분간 내 집 마련을 접어둔 상태다.
전세를 살고 있는지 아님 부모나 처가에 얹혀살고 있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지만 애당초부터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살이를 염두에 둔 듯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류다. 아무래도 전세가 상승에 대비해서나 또는 매매를 위해 준비해둔 비축자금이 조금은 넉넉한 모양이다.
때때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어도 집값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일희일비 없이 아예 맘 편하게 전세를 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 전세주택보다 비교적 거주기간이 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은 A에게 있어서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 물론 시장이 좋았을 경우에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요즘처럼 시장이 침체돼있고, 향후 시장 역시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집값의 등락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주택을 투자수단이 아니라 거주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니 굳이 대출을 통해 무리해서 내 집 마련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 않는다. 집을 살 돈이 마련되면 좋고, 집 살 돈이 없어도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면 더욱 그만이다.
[B는?] 반면 B의 주택구입에 대한 의지는 절실하다. 물론 이 역시 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전세난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가 됐든 전세만기 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고, 올려줘야 할 전세금 증액분이 부담이 될 판이다.
그래서 문제다. 조금 더 모으고 저축해서 상황이 좀 더 좋아질 때 내 집을 마련하면 좋으련만 나날이 오르는 전세가에 떠밀려 내 집을 사는 꼴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세가 상승과 달리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큰 폭으로 오른 전세가 인상분을 올려주고 또 다시 전전할 바에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물론 아직 전세가 상승폭만큼 매매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나머지 구입자금이 부담이지만 어차피 전세금 인상분도 부담인데 여기다가 일정 대출을 일으키면 될 성싶다.
금리가 낮은 것도 기회다. 코픽스를 이용하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하든 아니면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든 사상 최저금리라 할 정도로 대출금리가 낮다. 어느 경우에든 적용되는 금리는 변동이냐 고정이냐에 따라 3% 후반대에서 5% 중반대이다.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지만 집값 하락폭이 심한 곳 중에서 대출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를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 그렇다고 A와 B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만은 아니다. 집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수준만큼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다만 A의 주택구매시기가 ‘언젠가는’으로 표현된다면 B의 주택구매시기는 ‘집값이 오르기 전’이다. 아마도 올해나 늦어도 해가 바뀐 직후에는 내 집 마련 대열에 동참할지도 모른다.
또한 A, B 모두 정부의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 내지 규제완화도 바라지 않는다. 그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오히려 무주택자인 A, B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A는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을 A의 주택구매시점에 상관없이 반대하고 있는 반면 B는 당분간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B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세워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하는 것은 B가 내 집을 마련한 후의 일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B가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의 일이고 내 집 마련 후에는 시장이 자생적으로 회복하든 집값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든 어쨌든 집값은 올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집은 거주수단이기에 앞서 투자수단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A, B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 집 마련 후 집값이 올라 B가 웃을지, 아니면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돼 내 집 마련을 미뤘던 A의 판단이 옳았는지..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전세가 상승, 매매가 하락이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세가를 올려줘 전세살이를 계속했던 사람보다 일찌감치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사람이 성공을 거뒀다.
물론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그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상승력의 한계, 개발호재에 대한 정체성, 규제완화 카드의 한계성,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물량 공세 등 분명 과거와는 다른 상황에 접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어쩌면 해가 거듭될수록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집값 등락에 연연해하지 않고 단순 거주수단으로 여기는 A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만약 내가 무주택자라면? 닥터아파트(www.drapt.com)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