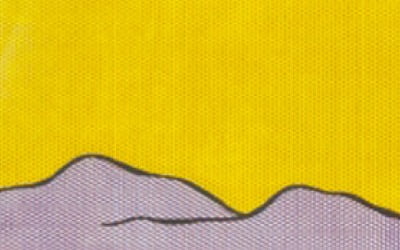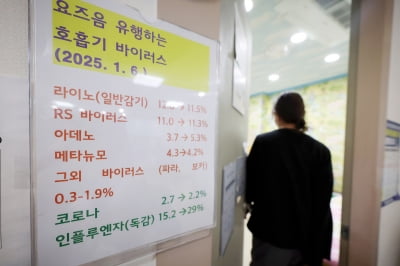뉴욕 경매서 낙찰…역대 3위
투자 상품으로도 최고
다우지수 18배, 금값 15배 오를 때
명품 바이올린, 48년간 194배↑

전설적인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다 빈치·엑스 세이델’(1714년 제작)이 10일(한국시간) 미국 경매업체 타리시오의 뉴욕 경매에서 1534만달러(약 194억원·수수료 포함)에 낙찰됐다. 역대 공식 경매에서 낙찰된 바이올린 중 세 번째로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맞았다.
이렇게 ‘사연 있는’ 바이올린만 비싼 건 아니다. 명품 현악기의 양대 산맥인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과르네리는 경매에 나올 때마다 ‘억’ 소리 나는 가격에 낙찰된다. 지난 3일 프랑스 경매업체 아귀트의 파리 경매에서 ‘과르네리 델 제수’는 350만유로(약 47억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다음달 7일 영국에서 열리는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 나오는 ‘헤일러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예상 낙찰가는 754만~1131만달러(약 95억~142억원)에 이른다.
400년 묵은 악기의 몸값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 일단 남아 있는 악기 수가 적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600여 대, 과르네리는 150여 대뿐이다.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기능적으로도 훌륭하다.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과르네리는 심오한 음색으로 니콜로 파가니니(1782~1840)부터 정경화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의 바이올린 거장들을 매료시켰다. 그러니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 대를 이어 상속되기 때문에 매물은 거의 안 나온다.
명품 바이올린은 더없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치가 하락한 적 없다. 연평균 가격 상승률은 10%에 달한다. 1960년 대비 2008년의 명품 바이올린 가치가 평균 194배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기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8배, 금값은 15배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한다. 여러 차례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요즘 만든 수천만원대 악기들이 매번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과르네리를 눌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음악가와 수집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의 지휘자 겸 작가인 존 액슬로드는 지난해 펴낸 저서《빅 노트:어떻게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음악과 돈을 만드는가》에서 “명품 바이올린이 예술가에게 주는 영감과 상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