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희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계곡서 놀던 아이들과 '쓰레기 논쟁'
"남들이 버린 걸 왜 우리가 치우나"
항변하더니 어느새 청소하고 가
먼저 실천 않고 남 가르치는 데 익숙
물 아끼고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어도
각자 뭔가 하는 것이 희망 만들어
이소연 시인
"남들이 버린 걸 왜 우리가 치우나"
항변하더니 어느새 청소하고 가
먼저 실천 않고 남 가르치는 데 익숙
물 아끼고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어도
각자 뭔가 하는 것이 희망 만들어
이소연 시인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7.29648277.1.jpg)
푸른님은 대체로 푸른 산을 뛰어오를 것처럼 가뿐하고 명료한 말하기를 구사했는데, 말이 조금도 늘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늘 여운이 감돌았다. 마지막 시간엔 그간의 읽기로 인한 변화를 담은 짧은 글을 써와 나누기로 했다. 그중 푸른님만 글을 못 써왔다며 대신 며칠 전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줬다.
“우리 집 가까운 곳에 계곡이 있어요. 날이 더워지니까 물놀이하는 애들도 여럿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 애들이 자기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안 치우고 그대로 두고 가려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가서 조곤조곤 말을 해줬어요.”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A.30288100.1.jpg)
“일단은 자기들 쓰레기가 아니래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곳에 다시 왔을 때 깨끗하면 너네도 좋지 않냐. 너희들이 버린 것이 아니더라도 치우는 것이 어떠냐, 그랬죠.”
“치우던가요?”
“아뇨,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래도 남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계곡이 더러워지면 너희도 손해 아니냐. 그러니 억울하더라도 치우고 가면 안 될까, 물었지요. 그런데 그 애들 하는 말에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러면 억울하더라도 아저씨가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그래 그 말도 맞다”는 말을 조용히 되뇌던 푸른님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가르침이 더 있었어요. 제가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그 애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갔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실천을 촉구하기보다 남을 가르치는 쪽으로 기울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한 에피소드다. 교육에서 전복은 언제나 우리를 신선한 충격에 빠뜨린다.
지금껏 읽기만 했을 뿐인데 다들 놀랄 만큼 멋진 글을 써왔다. 메일로 뒤늦게 도착한 푸른님의 글은 읽는 행위가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현장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 이전에는 현업에 필요한 실용서만 뒤적였다는 푸른님에게 닥친 이 변화를 열렬히 응원하고 싶다.
점심시간, 도서관 근처에서 밥집을 찾다가 우연히 앵두나무를 보았다. 그새 초여름이 왔다고 앵두가 빨갛게 익었다. 예전 같으면 하나쯤 따먹었을 텐데,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새 떼들도 멀리하는 것을 보면, 분명 앵두나무엔 문제가 있다. 새빨간 입술을 뽈록하게 내밀고 있는 모양을 보아하니 단단히 심통이 났다. 푸른님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아이들처럼 자동차 한 번, 보일러 한 번 때지 않은 앵두나무가 왜 먼지를 뒤집어써야 하냐고 따지고도 남을 일이다.
나는 환경에 예민한 앵두나무의 감수성을 상상한다. 그러면 다시금 물을 좀 아껴 쓰게 되고 텀블러를 챙기게 되고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게 된다. 하지만 환경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30년 전에 내가 하던 ‘환경보호 포스터 그리기’를 요즘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다. 이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친구인 김은지 시인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파괴되어 가는 자연 앞에서 무기력을 느낄 때면 헬렌 켈러의 말을 떠올린다고 했다. “나는 오직 한 명이다.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뭔가를 할 수는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거부하진 않겠다.”
구더기는 분해하는 힘이 있다. 그 힘으로 냄새를 지우고 살과 뼈를 지우며 죽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다. 희망을 의심하는 일에 무슨 힘이 있을까? 황인숙 시인은 ‘움찔 아찔’이란 시에서 구더기를 “낱낱이 몸을 트는 꽃잎들”이라고 표현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일이 희망을 의심하는 일보다 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까마귀는 따지고 들지 모르겠지만 김은지의 시 ‘북규슈’의 한 구절처럼 자연에 기대어서라도 희망을 말하고 싶다.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까마귀야/맑은 공기를 물어오렴/한 번도 쓰인 적 없는 시간을 물어오렴”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 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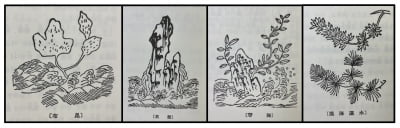

![[취재수첩] 산업부의 이상한 에너지 공청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2.24334515.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