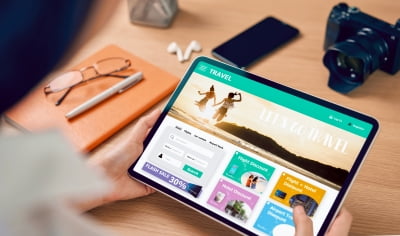일상 러너 기자의
마라톤팀 체험기
쉬엄쉬엄 뛰자 얕보다…
6km 뛰고 곡소리 절로
뛸 때 어깨와 팔은
위로 움직여선 안돼
다리도 살짝만 떼야
완주하니 고통은 잊어
"다시 하겠는데?" 생각

제대로 달려보고 싶었다. 6월의 둘째 날 오후 3시. 낮 기온 30도의 약간 습한 그날, 경기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선수들과 그를 지도하는 김민우 코치,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 팀에 합류했다. 하필 야근 다음날이었지만 ‘국민 영웅’과 달린다고 생각하니 피로감도 땡볕 더위도 상관없었다.
슬슬 뛰자고? 땡볕에 6㎞ 마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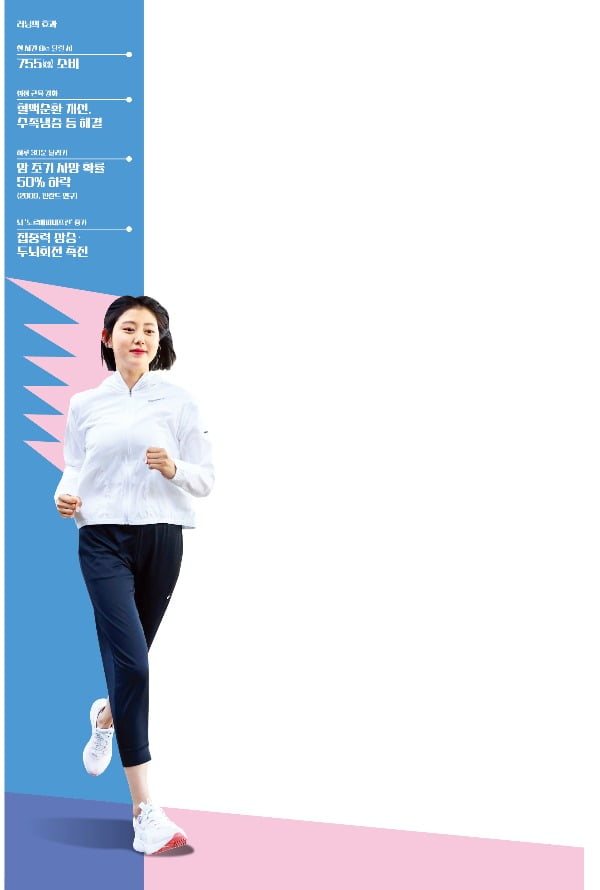
황 감독의 첫인사는 나를 안심시켰다.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를 골라 좀 덥게 옷을 입은 것 아닌가 걱정했는데 “오래 뛰지 않는 날은 오히려 ‘덥다’ 싶게 입는 게 같은 거리를 뛰더라도 운동 효과가 좋다”고 했다. 마라톤팀을 따라 달리기 장소로 이동하자 나무가 양옆으로 우거진 길이 나왔다. 다들 “여기가 하남의 센트럴파크”라고 했지만 이 말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 ‘길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다.
몸부터 풀었다. 발목과 다리뿐만 아니라 손목과 어깨까지 전신 스트레칭을 했다. 김 코치는 “달리기 전에 몸을 풀지 않으면 근육이 굳거나 부상 위험이 커진다”며 “다리뿐만 아니라 손목과 어깨, 목까지 모두 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얼마나 뛸 거냐고 물었다. “글쎄요, 슬슬 뛰어서 한 6㎞? ” 아…. 절망의 순간이었다. 카메라 뒤로 살며시 웃고 있는 사진기자 선배가 얄미울 지경이다.
4년간 몰랐던 ‘문제’를 깨닫다
황 감독의 배려로 마라톤팀의 선두에 서는 영예를 얻었다. 바로 옆엔 에이스 선수가, 옆과 뒤에도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다. 마치 포위당한 기분이랄까. 속도를 늦춰서도, 빨라져서도 안 되는 6㎞ 달리기가 시작됐다.“시작.” 구령 소리에 맞춰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뜀박질이 다 그렇듯 시작은 가볍다. 선수들과 줄 맞춰 뛰는 것이 처음엔 힘들지 않았다. 한 700m쯤 뛰었을까. 황 감독이 군단을 멈춰 세우고 나를 향해 진실의 ‘한 방’을 건넸다.
“폼에 문제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오래 뛰려면 팔이 많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깨는 마치 옷걸이다 생각하고 아예 움직임이 없어야 하고요. 지금은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팔이 어깨까지 올라가요.”
자세를 바꿔봤다. 손은 배꼽 위치에서 절대 올라오지 않게 앞뒤로 흔들었다. 팔이 덜 움직이니 상체에 바짝 힘을 주던 버릇이 사라졌다. 어깨에 힘이 빠지니 긴장도 풀려서 앞으로 더 잘 뻗어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3㎞ 반환점을 돌 때까지 속도를 맞춰 뛰었지만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뛰다 보니 이미 지쳐 있었다. 잠시 멈추자 등 뒤에선 땀이 주르륵 흘렀다. 돌바닥을 뛰어서인지 “무릎이 아프다”고 하자 코치는 “다리를 너무 높게 들고 달려서 그렇다”고 했다. 옆 선수들을 보니 다리를 살짝 지면에서 떼는 정도로만 뛰고 있었다. 순간 4년간 잘못된 자세로 무작정 달리기만 했던 내 몸에 미안했다.
끝까지 달려야 알게 되는 것들
선수들과 함께하는 한낮의 달리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뛰어도 뛰어도 출발했던 지점은 보이지 않았다. 같이 뛰는 선수들에게 속도가 붙으니 따라가기가 더 힘들었다. 남은 거리는 숙제하듯 뛰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버티고 버텼다.출발점이 저 멀리 보이는 순간, 끈적거리던 땀은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누군가 마법이라도 부린 듯 무겁던 다리에 힘이 붙었다. 드디어 완주. 파란 하늘과 태양과 울창한 나무가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발을 구르는 모든 순간마다 ‘다시는 이런 기획에 손 들지 않겠다’고 수만 번 다짐하며 달렸지만, 달리기를 멈춘 그 순간 생각했다.
‘어, 나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