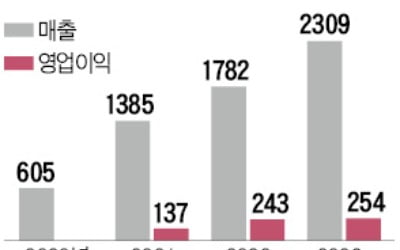'예약 서두르는 게 좋을 걸'…테슬라 이어 GM도 가격 기습인상 [모빌리티 신드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GM은 지난 18일 이후로 계약한 허머의 가격이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전 계약분에 대해선 전 가격(7만8400~9만8400달러)을 고수한다. GM과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내연기관차의 원자재 역시 급등했음에도 GM이 전기차 가격만 올린 것은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탄탄해서다. 허머 EV의 사전계약 대수가 7만7500대에 달하는 등 계약이 밀려있어 수시 인상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또 가격 인상으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게다가 앞으로 수요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으니 서둘러 예약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는 셈이다.
미국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6% 가량이다. 전기차 시장이 막 열리는 터라,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있는 셈이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도 자동차 기업이 원가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과거엔 경쟁사의 차량 가격과 소비자 눈치를 보며 조금씩 가격을 인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종의 ‘배짱 영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 지난달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은 15.7% 급등했다. 2012년에서 2018년엔 23% 올랐었다. 반면 중국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에선 1분기 기준 전기차 침투율이 17.7%로 대중화 초기 단계를 지났다”며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업체 니오가 중저가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와 GM의 이같은 가격 인상 정책은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큰 상황에도 자동차 업체들은 수요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판매 확대가 곧 수익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임 연구원은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중국은 수출기지로 활용할 수 있어 높은 수익성이 예상된다”며 “가격 인상이 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자동차·기아는 국내 시장에서 신차가 나올 때만 가격을 인상한다. 자동차는 고관여 내구재(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제품)인 데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만큼 소비자 불만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현대차는 지난 1분기 콘퍼런스 콜에서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졌지만, 이벤트(신차 출시)가 있을 때 가격을 올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집착증' 남편에게 매맞던 싱글맘, '세계1위 부자' 키웠다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35190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