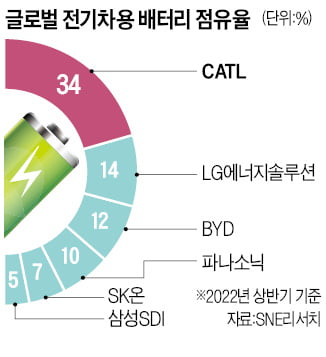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인 ㎾h당 100달러(약 13만원) 아래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476GWh로 예상되는 배터리 수요가 2030년에는 3750GWh로 7.8배 증가할 전망이다.
배터리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탓에 전기차 가격도 요지부동이다.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만만찮은 상황이다. 전비를 올려 주행거리를 늘리는 게 대안일 수 있지만 이 역시 구현이 어렵다. 배터리 무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전비와 주행거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현대차의 1세대 아이오닉5는 ㎾h당 6.3㎞의 복합효율, 1회 충전 때 주행거리 271㎞ 등의 성능을 갖춘 차량이다. 주행거리가 짧은 대신 배터리 가격이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소비자들은 싼 가격보다 짧은 주행거리에 주목했고 결국 현대차는 배터리 용량을 늘려야 했다. 무거워진 무게로 전비는 저해됐고 차값은 올라갔다.
자동차 종류별 판매량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기차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이가 소비를 결정한다. 국가 보조금은 전기차 소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을 주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때 제조사는 원가 절감, 제품 가격 인상, 두 가지의 절충점을 찾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대부분 절충점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일에 초점을 맞추되 주행거리 손실을 피하려 한다. 이 방법이 실패하면 차 가격을 높일 것인지, 적자를 보더라도 구매자를 끌어당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고 전기차 전환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각국의 강화되는 환경 규제는 내연기관차를 떨게 하는 요소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각 나라의 전동화 정책을 세 가지로 분류해 흥미로운 전기차 전망을 제시했다. 이미 발표된 전동화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면 2030년 지구상에 운행되는 차의 10%는 전기차로 채워진다. 그때까지 세계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금보다 5억 대 늘어난 20억 대로 예상하니 전기차 비중이 10%에 도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책은 어디까지나 변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행 약속을 전제로 예상해봤다. 이 경우엔 2030년까지 전기차는 2억7000만 대이며, 점유율은 14%다. 마지막으로 감축 목표를 강력하게 실행하면 2030년 누적 3억5000만 대의 전기차가 운행되며 점유율은 20%다. 연간 판매되는 전기차만 6500만 대로 예측된다.

결국 전동화는 가야 하는 길이다. IEA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당장 발등에 떨어진 배터리 가격 인상도 감내해야 한다. 과연 치솟는 가격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