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가장 어둡고 힘들 때 그린 '꿈'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별은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
알퐁스 도데와 윤동주의 '별'이
우주 탐사 첨단과학과 만나면…
고두현 논설위원

같은 해 작품인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과 뭇별이 소용돌이처럼 그려져 있다. 당시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이 강변에 앉을 때마다 목 밑까지 출렁거리는 별빛의 흐름을 느낀다”며 “별은 심장처럼 파닥거리며 계속 빛나고, 캔버스에서 별빛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여기에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고 덧붙였다.
우주 공간의 95%는 암흑
이듬해 생 레미 요양원에서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도 굽이치는 별무리가 등장한다. 은하수 사이에서 작은 운석들이 회오리치는 현상을 묘사한 듯하다. 그중 유난히 밝은 샛별(금성)이 보인다. 그 옆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나무가 어둡게 채색돼 있다. 이 장면을 그린 시간은 6월 중하순 새벽 3~4시라고 한다.그가 이토록 별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1888~1889년은 생을 마감하기 1~2년 전,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가난 속에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애썼지만 실패하고 고갱과 불화가 깊어지던 때이기도 했다. 결국 고갱과 다투고 귀를 자른 그는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아가 입원했다. 그야말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때였다. 이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듯, 그림 속의 별들은 짙푸른 어둠 속에서 미친 듯 소용돌이치고 있다.
별은 어둠을 먹고 자란다. 정진규 시인은 ‘별’이라는 시에서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고 노래했다. 그리고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고 했다.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난다는 의미다.
별
정진규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별들의 바탕인 우주는 실제로 어둡다. 광대한 우주 공간의 95% 이상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로 이뤄져 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보통의 물질은 4%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지구와 태양 등 ‘우리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전체 에너지의 0.4%밖에 안 된다. ‘천자문’도 첫 문장에서 ‘하늘(天)은 검고(玄) 땅(地)은 누르다(黃)’고 했다.
모든 천체를 아우르는 우주(宇宙)는 넓고 커서 끝이 없다. 한자로 ‘집 우(宇)’는 지붕과 처마처럼 넓고 큰 공간의 확대, ‘집 주(宙)’는 집의 기둥처럼 하늘과 땅을 떠받치는 시간의 격차를 뜻한다. 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천지간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이 곧 우주(space, the universe, the cosmos)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이런 시공간의 변화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니 놀라운 일이다.
암흑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별은 그 입구와 출구를 어떻게 비출까. 나희덕 시인의 ‘어둠이 아직’이라는 시를 보면 ‘별은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 별은 어둠의 망토에 달린 단추’다. 나아가 ‘어둠의 거미줄에 맺힌 밤이슬’이자 ‘어둠의 노래를 들려주는 입술’이다.

시적 상상과 기술력의 조화를
‘별의 입술’이 ‘어둠의 노래’를 불러줄 때, 우리 머리 위로 빛나는 별똥별이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에 나오는 장면. 주인집 아가씨가 유성(流星)을 보며 “저게 뭘까” 하고 묻자 목동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라고 대답한다. 그다음에 이 소설의 결말이자 백미인 명문장이 나온다.‘몇 번이나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었노라고. 그리고 그 별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이럴 때 별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순정한 ‘영혼의 빛’이다. 우리가 이 명구에 밑줄을 긋는 것은 이토록 순수한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싶기 때문이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은 어떤가. 그는 ‘별 하나’에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 등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새겨보다가 마침내 ‘어머니, 어머니’ 하고 사무치는 이름을 연거푸 부른다. 그러나 이들은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 너무 멀리 있어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둘 수밖에 없는 외로운 이름이다.
윤동주가 ‘서시’에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할 때 우리는 어젯밤과 내일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울 것을 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그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며 자신을 추스를 때 우리 또한 궁극의 희망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어둠이 깊을수록 꿈의 질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 모든 이치를 일찍 꿰뚫은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 모두 시궁창에 살고 있지만 우리 중 몇몇은 별을 보고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을 헤아리며 언약의 꿈을 키웠다. 이렇듯 우리에게 별은 희망과 꿈의 총합이다.
4일 칠석…모레는 '다누리' 발사
4일은 견우와 직녀성이 오작교에서 만나는 칠석, 모레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는 날이다. 이제 우리도 미지의 어둠 속으로 새로운 빛을 쏘아 올리게 됐다. 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과정이기도 하다.
무언가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뜻의 ‘만들다(make)’는 고대 그리스어(poietes)에서 유래했다. 이는 또 시(poem)와 시인(poet)의 어원이다. 과학자가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시인은 꿈과 마음을 만드는 사람이다. 과학자의 도구는 소재와 기술이고 시인의 연장은 언어와 상상력이다.
때로는 시가 현실이 된다. 오늘 밤에도 빛과 어둠 사이로 뭇별이 떠오르고, 우리 마음속 은하마다 수많은 꿈들이 피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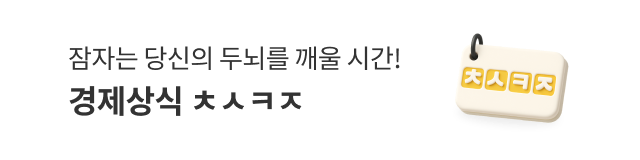
!['불화의 여신'은 오만과 편견의 틈을 파고든다 [고두현의 문화살롱]](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AA.30674979.3.jpg)
![미로에 갇혔다면 '다이달로스의 지혜'를 [고두현의 문화살롱]](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AA.30528586.3.jpg)
!["전쟁 잊은 나라엔 평화 없어"…한국에 묻힌 加노병 [고두현의 문화살롱]](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A.3038656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