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회사에 머물러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공동체 그늘에서 벗어나야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혁신 가능
경영진과 임직원의 결단 필요
유창재 증권부 마켓인사이트 팀장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공동체를 떠나야 할까. 답은 회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회사인가? 현재까지의 수익 구조로는 그렇다. 지난해 벌어들인 5464억원의 매출 대부분이 가맹 택시와 대리운전 호출 수수료에서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2015년 카카오가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인수하며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비전은 데이터 회사였다. 이동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물의 모든 이동을 편리하게 한다는 비전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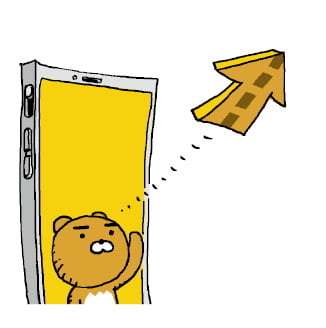
반면 독립 회사로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카카오는 국내에서 이동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택시와 승객, 그리고 승용차의 이동 데이터까지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자전거와 주차 등 라스트마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가능케 한다. 로보택시, 무인 물류,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근간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 웨이모, 중국 바이두와 경쟁할 국내 회사는 현재로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일하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고 5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날아오를 채비를 갖춘 셈이다. 향후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독립 회사로 있는 게 낫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기업공개(IPO)에 대한 시장과 정치권의 부정적 여론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카카오모빌리티에 카카오 공동체는 필요한가? 카카오T는 그 자체로 슈퍼앱이다. 3000만 명이 가입했고 월 1000만 명이 활발하게 사용한다. 카카오택시를 부르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을 여는 사람은 없다. 카카오 공동체가 도와주지 않아도 카카오T는 계속 슈퍼앱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주저할까? 카카오 공동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카카오프렌드 캐릭터가 새겨진 노란색 예쁜 명함이 주는 달콤함을 잃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인기 강사인 토머스 들롱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조직 심리와 변화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다. 변화의 두려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살아있다는 유일한 신호는 성장하는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봐야 성장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나 타이틀, 돈을 지키려고 할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오히려 안전그물은 사라진다. 성장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만 그물을 가질 기회가 늘어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카카오 공동체는 당장의 안전그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도전과 혁신을 위해선 그 그물을 벗어 던져야 한다. 거래 상대가 사모펀드이고 사모펀드는 이익만을 좇는다는 생각은 ‘미신(myth)’이다. 사모펀드나 모회사 카카오나 모두 기업 가치를 생각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당장의 택시 배차 수수료가 아니라 성장과 혁신에서 나온다. 처음에 꿈꿨던 모빌리티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이 카카오모빌리티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이다.


![[토요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왜 자꾸 사과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ZA.30334854.3.jpg)
![[토요칼럼] 우영우라는 심해(深海)](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7.24439280.3.jpg)
![[토요칼럼] 가이트너의 교훈…은행, 배당 늘려야 위기에 강해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7.2624300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