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발트뷔네 휘감은 80세 지휘자 바렌보임의 마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년만에 연 발트뷔네 연주회
노벨평화상 후보 오른 거장 지휘자
바렌보임 건강 문제로 작년 취소
실제 공연땐 꼿꼿하게 서서 지휘
"마지막 될 수도" 2만 장 매진돼
표 못 구해 바깥에 자리 잡기도
불의 춤·이베리아·볼레로까지…
'피아노 협연' 랑랑, 감동 더해
공연 이후 10분 넘는 '기립박수'
노벨평화상 후보 오른 거장 지휘자
바렌보임 건강 문제로 작년 취소
실제 공연땐 꼿꼿하게 서서 지휘
"마지막 될 수도" 2만 장 매진돼
표 못 구해 바깥에 자리 잡기도
불의 춤·이베리아·볼레로까지…
'피아노 협연' 랑랑, 감동 더해
공연 이후 10분 넘는 '기립박수'

팔순 맞은 거장 지휘자의 귀환
바렌보임은 ‘베를린을 상징하는 예술가’로 통한다.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와 베를린 국립오페라단 지휘를 맡았던 그는 1999년 창단한 WEDO와 함께 통합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WEDO는 ‘앙숙’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화합을 위해 바렌보임이 팔레스타인 출신 영문학자 겸 사회운동가인 에드워드 사이드와 함께 양측 청소년 연주자들을 모아 설립한 악단. ‘웨스트-이스턴 디반’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서동시집’이다. 이 명칭은 독일 대문호 괴테가 1818년 발표한 12권짜리 시집 제목에서 따왔다.이렇게 출범한 오케스트라는 매년 8월 ‘공동 창업주’인 바렌보임의 지휘에 맞춰 발트뷔네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공연은 취소됐다. 이후 바렌보임의 염증성 허리 질환이 심해져 지난 5월 베를린 공연도 무산됐다.
이번 공연은 그래서 더 특별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장의 지휘를 보려는 음악 애호가들이 몰리면서 2만 장의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객석은 한껏 차려입은 젊은 커플부터 지팡이를 짚은 노(老)부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관객들로 가득 찼다. 표를 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은 음악소리라도 듣기 위해 공연장 바깥 숲속에 자리를 폈다.

이번 공연은 현대 프랑스 음악의 대표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열고 닫았다. 첫 곡은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스페인 광시곡’. 신비롭고 서늘한 느낌을 주는 1악장 ‘밤의 전주곡’은 구름이 짙게 깔린 이날 날씨와 맞아떨어졌다.
오랜 기간 바렌보임과 손발을 맞춰온 랑랑은 독일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스타’였다. 그가 등장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스페인 낭만주의 작곡가 마누엘 데 파야가 만든 ‘스페인 정원의 밤’은 랑랑의 과장된 제스처와 만나 ‘듣는 재미’와 함께 기억에 남을 ‘볼거리’도 안겨줬다. 랑랑은 1부의 앙코르곡으로 같은 작곡가가 만든 발레곡 ‘사랑은 마법사’ 중 가장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 ‘불의 춤’을 택했다. 때마침 해가 기울어 붉은 조명이 야외무대를 밝혔다. 랑랑은 연주곡 이름처럼 손끝으로 ‘불의 춤’을 췄다.
2만 명이 보낸 ‘10분짜리 박수’
2부의 시작은 클로드 드뷔시의 ‘이베리아’가 장식했다. 드뷔시는 평생 딱 한 번 스페인 땅을 밟았지만, 그 인상이 어찌나 강렬했는지 여러 차례 그 이미지를 음악에 담았다. WEDO는 이 곡을 관능적이고 리듬감 있게 해석했다.피날레는 라벨의 대표곡인 볼레로였다. 라벨의 마지막 오케스트라 작품인 볼레로는 첫 공연 당시 라벨 스스로 “나는 단 하나의 걸작을 썼다. 그것은 볼레로다. 하지만 불행히도 볼레로에는 음악이 없다”고 혹평한 레퍼토리다. 같은 멜로디가 169번이나 반복되는 이 곡을 듣는 동안, 라벨의 혹평과는 정반대로 ‘볼레로 안에 얼마나 많은 음악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리듬, 여러 악기가 빚어낸 다양한 음색, 그리고 음악의 명장들이 뿜어내는 폭발적인 힘이 어우러진 공연이 끝나자 모든 관객이 일어나 10분 넘게 갈채와 환호를 보냈다. 공연장은 곧 관객들이 켠 스마트폰 플래시로 하얗게 물들었다.
바렌보임과 랑랑, 그리고 WEDO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독일 쾰른,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스위스 루체른페스티벌 등에서 총 아홉 번의 공연을 마쳤다. 바렌보임은 “나의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젊은 음악가들과 다시 함께하게 돼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른다”고 했다. 랑랑도 “나의 친구이자 멘토인 바렌보임과 다시 일할 수 있어 기쁘다”며 “WEDO와 함께 멋진 음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베를린=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리뷰] 넷플릭스 영화 '카터', 화려한 액션·독특한 촬영기법…정작 중요한 '개연성'은 부족](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087688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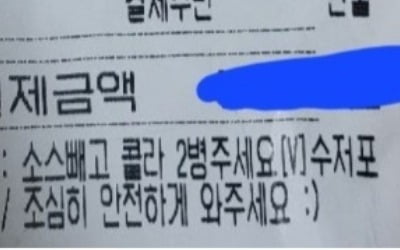
!['비상선언', 이제 그만 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주세요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822358.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