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중수익"…대기업은 '신명품'에 집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물산·신세계인터내셔날 등
'메종키츠네' '아미' '알렉산더왕'
검증된 해외브랜드 수입 열올려
'메종키츠네' '아미' '알렉산더왕'
검증된 해외브랜드 수입 열올려
길거리 브랜드들이 독창성을 중시하며 자체 역량 강화에 힘을 쏟지만 국내 패션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이른바 ‘신명품’ 브랜드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에서 인기와 품질이 검증된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물산과 신세계인터내셔날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일찌감치 2010년부터 ‘메종키츠네’ ‘아미’ ‘르메르’ ‘톰브라운’ 등 해외 브랜드를 들여왔다. 지난달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아미 단독 매장을 추가로 여는 등 오프라인 점포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역시 ‘메종마르지엘라’ ‘알렉산더왕’ ‘사카이’ 등을 들여와 국내 신명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기업 가운데 토종 고가 패션 브랜드 판매에 집중했던 한섬도 최근 스웨덴 디자이너 브랜드 ‘아워레가시’와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패션 대기업들이 해외 브랜드 판매를 확대하는 건 ‘저위험·중수익’ 매력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 브랜드는 수입 전 해외 시장은 물론 국내 ‘직구족’들의 반응을 통해 성공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신규 론칭 브랜드보다 마케팅 비용도 상대적으로 덜 든다.
해외 브랜드 집중 전략은 경영 성과로도 이어졌다. 올 2분기 삼성물산 패션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5150억원이다. 영업이익도 44% 증가한 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3839억원, 38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 46% 불어났다.
다만 국내에서 인지도를 높인 해외 브랜드가 수입사와의 계약이 끝나면 직접 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 브랜드 육성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산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국내에 진출했던 ‘폴로 랄프로렌’이 계약이 끝나자 2011년 직접 한국 공략에 나선 게 그런 사례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해외 브랜드의 경우 계약상 이유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고 다른 디자이너 및 브랜드와 협업하는데 제한이 많다”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해외와 국내 브랜드의 적절한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해외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물산과 신세계인터내셔날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일찌감치 2010년부터 ‘메종키츠네’ ‘아미’ ‘르메르’ ‘톰브라운’ 등 해외 브랜드를 들여왔다. 지난달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아미 단독 매장을 추가로 여는 등 오프라인 점포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역시 ‘메종마르지엘라’ ‘알렉산더왕’ ‘사카이’ 등을 들여와 국내 신명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기업 가운데 토종 고가 패션 브랜드 판매에 집중했던 한섬도 최근 스웨덴 디자이너 브랜드 ‘아워레가시’와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패션 대기업들이 해외 브랜드 판매를 확대하는 건 ‘저위험·중수익’ 매력이 크기 때문이다. 해외 브랜드는 수입 전 해외 시장은 물론 국내 ‘직구족’들의 반응을 통해 성공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신규 론칭 브랜드보다 마케팅 비용도 상대적으로 덜 든다.
해외 브랜드 집중 전략은 경영 성과로도 이어졌다. 올 2분기 삼성물산 패션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5150억원이다. 영업이익도 44% 증가한 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3839억원, 38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 46% 불어났다.
다만 국내에서 인지도를 높인 해외 브랜드가 수입사와의 계약이 끝나면 직접 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 브랜드 육성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산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국내에 진출했던 ‘폴로 랄프로렌’이 계약이 끝나자 2011년 직접 한국 공략에 나선 게 그런 사례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해외 브랜드의 경우 계약상 이유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고 다른 디자이너 및 브랜드와 협업하는데 제한이 많다”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해외와 국내 브랜드의 적절한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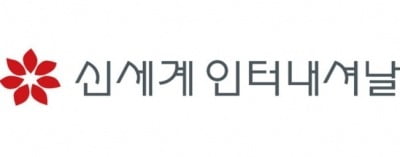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