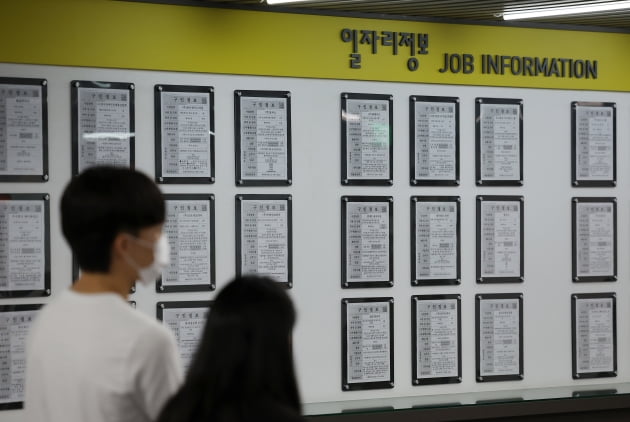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018년 1월 첫 도입 후 사업이 종료된 올해 6월까지 9조2070억 원에 달했다.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 더한 예산은 총 10조3194억 원에 이른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리며 시작됐다. 커진 인건비 부담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과 직원 줄이기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올라간 최저임금 일부 금액을 사업주에게 보전해준 것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339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매년 2조 원가량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받아 고용된 근로자의 30%(연평균 102만 명)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돈까지 대주며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정작 해당 사업장 직원들은 일을 그만둔 사람이 많았던 셈이다. 혈세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쓰이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임 의원은 "차라리 10조 원을 들여서 저임금 근로자들에 제대로 된 재취업 교육을 했다면 더 나은 일자리를 얻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