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잡은 돼지고기를 누구나 먹을 '권리'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틀이나 삼일쯤 농사 일이 끝나면 감사의 의미로 마을 주민들이 동네 하천 모래톱에서 토실한 돼지를 잡았다. 요즘은 금지된 일종의 밀도축이었는데 커다란 솥에서 삶아 낸 보쌈 고기는 된장만 발라 먹어도 한 여름 고된 노동의 여운이 모두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30여 년 전의 ‘우리’를 실감나게 묘사한 ‘응답하라 1988’ 시리즈를 떠올려보라. 신문지에 돌돌 말린 삼겹살을 보무도 당당하게 들고 오는 가장의 모습이 나온다. 그가 가져 온 물컹한 느낌의, 겉면이 울퉁불퉁한 돼지고기는 요즘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단단한 느낌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엄마의 부엌에서 숭덩숭덩 썰려 김치찌게의 화룡점정으로 들어가곤 했던 돼지고기의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다.
신문지에 쌓여 있던 '물컹' 삼겹살의 추억
역설적이게도, 축산 유통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갓 잡은 돼지고기를 먹을 일은 점차 줄어들었다. 유통업자들은 냉동에서 돈을 발견했다. 삼겹살을 꽝꽝 얼렸다가 가격 등락에 맞춰 시장에 풀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었다. 1990년대 대학가를 휩쓸었던 대패 삼겹살은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의 단백질 보충원으로 맹활약했지만, 맵고 짠 파절이 없이는 먹기 힘든 그런 맛이었다.저온 냉장 유통망의 확충도 돼지고기 맛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다. 굳이 얼리지 않아도 도축장에서부터 정육점까지 돈육의 붉은색을 유지시키면서 몇 달을 유통시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유통된 삼겹살을 구우면 ‘드립(drip)’이라고 불리는 하얀 기름이 흘러나온다. 맛있는 돈육 특유의 육즙은 기대하기 힘들다.
최근 들어 돈육의 유통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이들이 생긴 건 삼겹살 애호가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갓 잡은 돼지고기를 먹을 ‘권리’를 살리려는 유통의 파괴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2020년에 선보인 ‘3일 돼지’라는 상품이 대표적인 사례다. 증평에 있는 국내 최대 미트센터인 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에서 도축 후 매장에 진열되기까지 3일째인 돈육이다.
정육각도 도축 후 4일 이내의 돼지를 주로 판매한다.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전날 도축한 돼지를 야간 작업을 해서 만 24시간 이내에 주문자의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일도 있다. 그간의 축산 유통 관행에 비춰보면 가히 혁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롯데마트와 정육각의 신선한 삼겹살을 먹어보면 본래 돈육의 참맛이 무엇인 지를 알게 된다. 유명 삼겹살 맛집 ‘저리 가라’다.
찬사 받아 마땅한 유통의 파괴자들
기존 유통 질서를 깨는 일은 엄청난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축산물 스타트업이 중간 도매상들을 건너 뛰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려면 미트센터 등의 자체 물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인프라의 문제 때문에 대기업 계열인 롯데마트조차 아직은 ‘3일 돼지’를 전점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정육각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폐기율을 최소화하면서 많이 팔아야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데이터’를 축적할 시간이 필요하다.쿠팡은 공급자 위주의 배송을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뒤집으면서 유통의 혁신 기업으로 등극했다. 작년 초에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에 성공한 건 천운에 가까운 일이었음이 투자의 빙하기인 요즘 더욱 두드러진다. 당분간 이런 행운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의 회’라는 신선한 발상을 내놓은 수산물 스타트업이 좌초 위기에 봉착한 것도 과감한 물류 확충 이후 투자금이 뚝 끊긴 탓이다. 스타트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 유통 스타트업들의 혁신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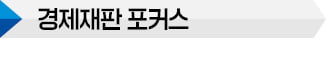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