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했는데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실혼 가정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임차권 승계를 두고 남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혼 가정의 세입자라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절차에 따라 임차권이 승계되지만, 사실혼 가정의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문제는 복잡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이 있는 전, 월세 계약의 임차권도 상속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재산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한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승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9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순 없지만,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주거 및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임차권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남은 배우자의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요.
2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 상속합니다. 임대차법 제2항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은 있지만,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남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 세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세 계약이 해지되면 집주인은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과 남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각각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공동 임차권자가 됐다면 그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해당 사례에 관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급심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에게 공평히 배분된 판례가 많았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주거 생활을 한 상황을 인정받아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에 준하는 상속 비율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임차권 승계 절차를 이어 나갈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임법 제9조 제4항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 승계는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도 승계되지만, 과정에서 생긴 채무도 승계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세입자가 생전에 빚이 많아 임차권에 저당이 잡혀있거나 수개월 간 월세를 밀려 보증금 이상으로 채무가 쌓여있다면 임차권을 승계받는 사람이 대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3항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1개월 이내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후 1개월 내 집주인에게 임차권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자에 대한 자격을 부정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이미 법률상 임차권 승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나도 모르게 주소가 인천→울산…2억 고스란히 날릴 판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590773.3.jpg)
!["권리금 소송하려면…건물주가 방해해야 가능"[아하! 부동산법률]](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99.3072002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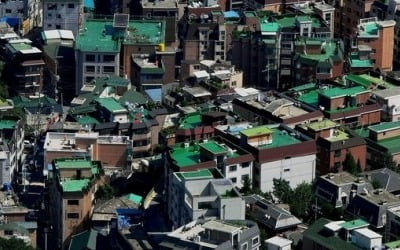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