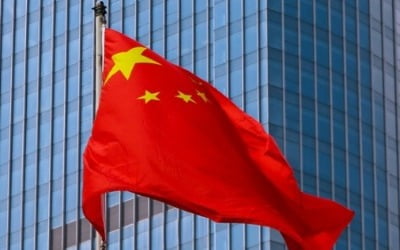경제 분야에서 빨간색(레드)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증권 시장에선 '상승'의 색이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빨간 불이 켜졌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다면 좋은 쪽이든 아니든 무언가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드북에선 미래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를 추적합니다.

시간이 흘러 40년 전 공장에 들어왔던 청년들은 노인이 돼 정년을 맞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의 공장을 찾는 청년도 줄었다. 20년차 중년 직원도 아직 후배보다 선배가 많았다. 신입 구하기가 어려워지다보니 임금도 올랐고, 자연히 제품 가격도 올라갔다. 설상가상으로 공장에 주문을 주고 물건을 사줬던 바이어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판로도 막혔다. 시장에선 더 이상 예전처럼 싼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고령화와, 이들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켰던 ‘세계화’의 후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은 1990년대 이후 이전까지 5%를 넘겼던 미국와 유럽의 소비자물가(CPI)상승률은 2~3%대로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0)금리 수준의 초저금리가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디플레이션 시대’는 2020년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막을 내렸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물가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찰스 굿하트 런던정치경제대(LSE) 명예교수는 “통화정책이 아닌 인구구조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의 고령화는 향후 20여년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언했다.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 시작” 예언 현실로
굿하트 교수는 영국 중앙은행(BOE) 수석 고문 및 BOE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통화이론 전문가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 발표한 책 ‘인구대역전’을 통해 그는 이듬해인 2021년 인플레이션이 5~10%대로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의 ‘예언’는 현실이 됐다.
굿하트 교수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유효 노동공급은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7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90년부터 2017년 사이 2억4000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의 생산가능인구는 6000만명 증가에 그쳤다.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대적인 이주가 이뤄지면서 2000~2017년 사이 중국의 도시 인구는 3억7000만명이 늘어났다. 풍부하고 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돼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소련 해체 이후 2억명에 달하는 동유럽의 생산가능인구도 세계 경제에 편입됐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진행된 세계화는 새롭게 공급된 노동력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세계 교역량은 1990년~2017년 연평균 5.6% 증가했다. 같은 시간 GDP 성장률(2.8%)보다 2배나 큰 수치다.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7%에서 2017년 26.6%로 3배 늘었다.
시장엔 돈이 풀렸다. 19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전 세계가 대규모의 팽창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반복했다.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0년 사이 2~3배씩 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기를 0%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21세기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해인 2019년까지 미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17%에 불과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인플레이션율은 5.0%였고, 과도기인 1990년대엔 3.2%였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율은 2000년대 이후 1%대에 머물렀고, 한국도 2.4%에 그쳤다.
○인구감소에 탈세계화까지 인플레 압력↑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무한히 공급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굿하트 교수의 요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유엔(UN)이 지난 7월 발표한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14억5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중국의 인구는 2040년 13억7800만명으로 감소하고, 50년 뒤인 2070년엔 10억8500만명으로 4억명 가까이 줄어든다.원인은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이다. 1970년대 가임여성 1명당 6.09명에 달했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1.18명으로 낮아졌다. 1992년 출산율이 2명선이 깨진 뒤 20년째 1명대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히 인구 구조도 급속도로 악화 중이다. 올해 69%에 달하는 중국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70년 53.5%로 줄어든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인구 비중은 13.7%에서 36.9%로 3배 가까이 뛴다. 이 기간 중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9억8000만명에서 5억8000만명으로 줄어든다.

중국의 고성장 토대였던 세계화 시대도 끝나가고 있다. 올해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은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창설하고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을 첨단 산업의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으로 구성된 ‘칩4 동맹’ 구축을 추진 중이다. 30~40년 간 물가 안정을 이끌어온 미국의 소프트웨어, 한국의 부품, 중국의 제조라는 세계화의 성공 방식이 깨지고 있는 셈이다.
굿하트 교수는 “로봇과 인공지능(AI)기술이 1인당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인도나 아프리카가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다”면서도 “인구 변동의 역풍과 충격을 누그러뜨리기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세계적인 물가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굿하트의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며 “그간 전 세계 중앙은행은 2%를 물가 안정 목표로 잡았지만 앞으론 완전히 다른 목표를 세워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중국 상장 항공사 8곳, 3분기까지 누적 적자 21조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ZK.314857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