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9년 만의 단편소설집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출간한 소설가 김연수는 지난해 어느 단편소설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특히 결말부를 읽으면서. 미문(美文)으로 유명한 그가 "마지막 문장이 좋아서 자꾸 반복해 읽게 된다"고 했다.
지난달 만난 소설가 김연수가 최근 인상 깊게 읽은 작품으로 꼽은 건 백수린 작가의 단편소설 '아주 환한 날들'이다.
이 소설은 혼자 사는 노년 여성 '옥미'가 사위로부터 앵무새를 반강제로 맡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뤘다.
옥미의 삶에 끼어든 앵무새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댄다. 앵무새에게 하루에 두 번씩 물과 사료를 챙겨주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거실 바닥에 날리는 노란 솜털을 치우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리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앵무새를 돌보는 과정에서 옥미는 자신이 잊고 있던 따뜻한 돌봄의 기억을 되새긴다. 앵무새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 온기는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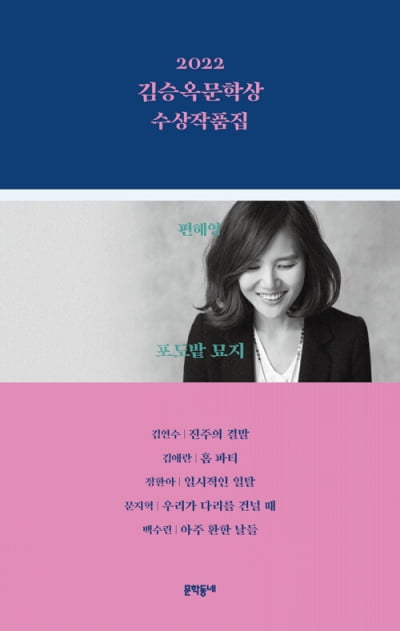
'아주 환한 날들'이 주목하는 건 아주 작은 온기다. "마룻바닥은 새가 닿았던 자리만큼의 크기로 따스했다." 옥미가 견고하게 쌓아올린 고독의 벽은 그 조그만 따스함으로 무너진다. "사람들은 기어코 사랑에 빠졌다. 상실한 이후의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자꾸 나쁜 일이 생기고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간신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희망은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소소한 일상, 평범한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기억에 있을 것이다. 되풀이되는 재난은 그 소중함을 일깨운다.
김 작가는 <이토록 평범한 미래> 수록작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려고 애쓸 때, 이 우주는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 '기억의 힘'을 말하는 이 소설은 2014년 세월호 침몰 몇 달 뒤 발표된 소설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공공선·자기희생…자유주의가 '잃어버린' 것들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347225.3.jpg)
!['오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34585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