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구 1970년부터 51년간 2000만 늘 때
먹거리 고급화·비싼 쌀값에 쌀 소비 80㎏↓
정치권, 혈세로 가격하락 인위적으로 막아와
농지의 매매와 전용 제한한 낡은 규제 풀어
쉽게 농사 그만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식량안보 걱정?…땅값 싼 나라 투자하면 돼
박병원 한경 객원대기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경총 명예회장

정부와 여당은 예년 35만t이던 공공비축분을 45만t으로 늘리고, 공급초과 예상치 25만t보다 20만t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쌀 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한술 더 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쌀을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만든 게 ‘농민을 위해서 쌀 산업을 망쳐 놓은’ 정치권인데 여야가 공히 역주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쌀 생산 감소 정책 펼쳤지만…

국내 인구는 1970년 3224만 명에서 2021년 5175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는 1970년 136.5㎏에서 2021년 56.9㎏으로 줄었다. 밥쌀 소비도 같은 기간 440만t에서 294만t으로 감소했다.
국민이 이렇게 쌀을 외면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쌀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쌀값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만큼 높은 가격이 부담돼 소비가 줄었다는 데 쉽게 동의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중산층 이상의 생각이다. 어려운 계층은 김치 등 반찬과 국이 있어야 하는 쌀이 한 끼를 때우는 데 비싸다. 마음대로 쌀을 사 먹지 못하고 라면 등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탄수화물로부터의 탈출’로 요약되는 먹거리의 고급화가 쌀 소비 감소의 더 큰 원인이다. 1970년 고기를 인당 5.2㎏ 정도 먹던 우리 국민이 2020년에는 52.5㎏이나 먹게 됐고 달걀, 치즈 등 축산물 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채소 소비량은 1975년 62.5㎏에서 현재 150㎏으로, 과일은 1980년 22.3㎏에서 51.5㎏으로 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다른 모든 먹거리가 국제 경쟁 가격으로 수입되는 가운데 국제 가격보다 여섯 배(쌀 수입에 매기는 관세율 513% 기준) 비싼 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패퇴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WTO 출범 때 쌀 수입만 막으면 쌀 산업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현재 매년 40만9000t)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쌀이 쌀하고만 경쟁하겠는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상호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농가의 과반을 점하던 쌀 농가(현재는 103만 농가 중 39만 농가로 전체의 38%)에 아부하려고 쌀 수입을 막고 매입 가격을 계속 올려준 정부(사실은 정치권)는 쌀 재배 농가가 ‘이대로 살다 죽게’ 해주려고 쌀 산업을 초토화하는 길을 택한 셈이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정부는 쌀 매입 가격을 연평균 2.1%, 총 124% 인상했다. 그동안 일곱 차례 인하하기도 했으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쌀 산업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다. 그러나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쌀 가격을 21.2%나 떨어뜨린 일본과 비교하면 속도만 늦췄을 뿐 한국은 역주행을 계속해 왔다. 일본은 한국 다음으로 쌀 정책을 잘못한 국가로 꼽힌다.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일본은 1968년 1450만t이던 쌀 생산량을 2016년 920만t으로 36.6%나 떨어뜨렸고, 대만은 1980년대 중반 220만t에서 2016년 126만t으로 42.8%나 떨어뜨렸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각각 50.7㎏, 44.1㎏이다. 이 나라는 쌀 소비가 어디까지 줄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혈세 낭비하는 쌀값 떠받치기

쌀 수요 회복 쉽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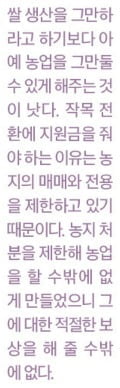
작목 전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쌀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 국제 경쟁 가격에 노출된 다른 작목의 수익성을 쌀보다 좋게 만들어줄 정도로 보조금을 주기는 어렵다. 기계화가 쌀 중심으로 진전됐고, 농촌의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어서 노동집약적인 원예농업인 과일, 채소 등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등은 쌀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아도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 증가가 초래할 가격 폭락을 걱정해야 한다. 농지 소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가장 쉽게 충족할 수 있다는 것도 쌀농사를 계속하게 하는 요인이다. 거의 완전 기계화가 돼서 영농조합법인에 맡기면 땅 주인이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쌀농사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지 전용 과감히 허용해야
쌀 생산을 그만하라고 하기보다 아예 농업을 그만둘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다. 작목 전환에 지원금을 줘야 하는 이유는 농지의 매매와 전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 처분을 제한해 농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농지를 사기 어렵게 해놓은 규제는 팔기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좋은 값을 받기도 어렵다. 상대적으로 전용이 쉽다고 기대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진흥지역 안의 농지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밭값이 논값보다 비싼 현실은 쌀 재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아플 수밖에 없다. 쌀값을 얼마나 높게 유지해 주면 쌀 재배 농가의 이런 불이익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될까.
고(高) 미가(米價)와 고(高) 지가는 어느 쪽이 닭이고 달걀인지도 모호하지만 현재의 고지가에서 농업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 농지 가격은 제일 싼 진흥지역의 논이 3.3㎡당 15만원을 넘는다. 미국의 평균 33배, 일본의 3.6배다. 토지용역대(땅 사용료)가 쌀 생산비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만 해도 10.6%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유지시키려면 농지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지주의 횡포는 존재할 수도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무질서한 농지전용이 걱정되는가. 지금까지도 다른 용도로 땅이 필요할 때는 전용을 했고, 수요도 없는데 전용하지는 않았다. 1970년 230만㏊이던 농지는 이제 155만㏊로 거의 3분의 1이 줄었다. 주거용이든 사업용이든 도로, 수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개발사업이 이뤄질 리가 없다. 어차피 전용은 필요 이상은 이뤄지지 않으며 기개발지역과의 경계지역에서만 행해진다. 규제가 별 차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이다. 필요한 위치의 농지나 임야를 언제라도 사고팔고 전용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경제의 암인 고지가를 견제하고 투자 활성화와 주택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오직 선제적 가용토지 공급으로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식량안보, 지나친 걱정할 필요 없어
농지를 축소하자고 하면 당장 식량안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식량자급과 혼동하지 말자. 한국은 식량자급이 불가능한 나라다. 한 푼의 달러라도 기계와 원자재 수입에 더 써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농민의 증산 의욕을 북돋우고 소득수준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고미가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이제는 아무리 식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외화 획득 능력에 달려 있지 국내 생산에 달려 있지는 않다.맬서스의 주장은 허구로 끝났다. 1961년 이후 세계 인구는 30억8000만 명에서 최근 79억 명으로 2.6배 증가했는데 쌀, 밀, 옥수수의 생산량은 각각 3.5배, 3배, 5.5배 증가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4~3배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고, 경작 면적은 밀과 보리의 경우 줄어들기까지 했다. 대두는 1970년 4600만t에서 2010년 2억5600만t으로 늘었다.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낮아서 과잉생산 시 가격이 폭락하게 마련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축산물 소비와 사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2000년대 초에 곡물수입국이 됐다. 곡물이 부족해진다면 일차적으로 사료용을 덜 심고 식량용을 더 심어 해결하게 될 것이다. 돼지고기 한 끼분 생산에 사람이 열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곡물이, 닭고기는 여섯 끼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축산물 소비 조절을 통한 식량 수급 조절 여지는 상당하다.
곡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곡물 메이저사의 주요 관심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는 일이다. 많은 나라가 공급을 늘릴 여력을 갖추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경작 가능한 땅을 엄청나게 늘릴지도 모른다.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높아지면 이런 ‘노는 땅’들이 생산에 투입될 것이고 종자 개량과 관개, 배수 등 농업 인프라 투자 확대와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 등으로 곡물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아직 많다. 정히 식량안보가 걱정된다면 땅값이 싼 나라에 가서 농업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다. 한국 땅값은 너무 비싸서 국제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곡물을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곡물의 공급이 차질을 빚는 사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남·북반구의 생산 시기가 달라서 반년만 지나면 많이 완화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된다고 믿어도 된다.
농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기로 하자. 쌀값을 지켜주기를 원하는지, 농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농민에게 물어보자. 너른 들판 한복판에 논을 가진 사람은 전자를 원할 것이고, 탈농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후자를 원할 것이다. 후자를 허용하면 쌀 공급이 줄어서 전자는 저절로 이뤄진다. 하나의 결정으로 온 국민을 묶어놓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낫다. 땀 흘려 생산한 쌀이 사실상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지,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 보자.


![美 IRA '섹션 13401'과 한국 기업·정부가 해야 할 일 [김일규의 IRA 집중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AA.31816850.3.jpg)
![혁신과 기득권 싸움 끝은…토스의 성공일까, 타다의 좌절일까 [김주완의 스타트업 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AA.31690210.3.jpg)
![먹구름 낀 韓무역…中경제 살아나도 흑자회복 장담 못한다 [도병욱의 무역적자 짚어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AA.31625234.3.jpg)

![[단독] "사복 경찰이 여자 집어던졌다"…서부지법 '아비규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3444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