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사회'에서 사랑을 외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앨리 스미스 <봄>, <여름> 출간
'최고 정치소설' 오웰상 수상
고립, 대립의 세상 속
인류애의 필요성 다뤄
'최고 정치소설' 오웰상 수상
고립, 대립의 세상 속
인류애의 필요성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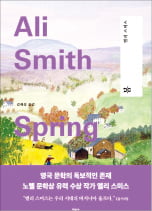
그 4부작을 마무리하는 작품인 <봄>과 <여름>이 최근 한국어판으로 나왔다. 영국에서 2020년 8월 출간된 <여름>은 최고의 정치소설에 주어지는 조지 오웰상을 받았다. 2016년 나온 첫 권인 <가을>은 이듬해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문학 프로젝트다. 당대 사회 현안을 담은 독립적인 장편소설을 쓴 뒤 제목에 해당하는 계절에 출간한다는 것이 스미스의 아이디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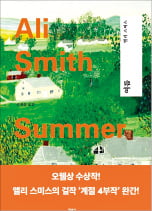
배경은 겨울이지만 인물들은 저마다 특별했던 자신들의 여름 이야기를 들려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환경 파괴, 이민자 배척과 좌우 갈등, 심지어 병상에 누운 대니얼의 회상을 통해 나치의 만행까지 다루지만 작가는 우아한 필치로 ‘투쟁’을 외치기보다 ‘사랑’을 말한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언젠가 노벨문학상 작가를 배출한다면 1순위로 꼽히는 작가다. 부커상 최종 후보에만 네 차례 올랐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 퇴사의 시대에 기업이 맞설 7가지 'HR 방패'](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A.32075363.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