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국민국가에서도 유서 깊은 국가의 강제성은 여전하다. 국민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선동과 제도의 폭력으로 결집하는 포퓰리즘과 전체주의의 무수한 사례가 그 증좌다. 국민을 참칭하는 기술이 세련돼졌을 뿐이다. 자칭 민주국가 역시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실패가 잘 보여준다. 포용은 ‘선거용 코스프레’에 불과했고 빈부 격차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벌어졌다. 국가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호도가 부른 예정된 결말이다. 결핍에 시달리는 국민의 불안감을 파고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제안은 얼마나 달콤한가. 하지만 폭력 독점에 의존하는 국가는 문제해결 능력에서 시장이나 개인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앞세울 뿐 한정된 재원을 지배세력의 이해에 맞춰 배분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다.
‘문재인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엉뚱하게 국가론을 들고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하자 “국민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가”라며 맹비난한 것이다.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라고도 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을 불과 5년 만에 지속 불가능 상태로 타락시킨 데 대한 미안함은 실종이다. ‘어버이국가’가 선(善)인데 왜 따르지 않느냐는 저급한 국가주의에 대한 집착만 가득하다.
나치즘은 ‘아이를 키워주고 병을 치료해주겠다’는 국가의 선의에 개인의 자유를 위탁한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결과였다. 서해 피살 은폐를 적극 옹호한 윤 의원의 어설픈 국가론이 국가자살론처럼 들린다.
백광엽 논설위원 kecorep@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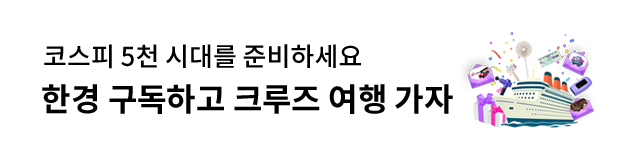
![[천자칼럼] 달과 6번 아이언 그리고 헬륨3](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A.32106284.3.jpg)
![[천자칼럼] 국회선진화法 사망선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A.32097582.3.jpg)
![[천자칼럼] 모로코의 재발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A.3209044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