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공방(漢詩工房)] <특집 : 소동파(蘇東坡)의 시로 맛보는 한시(漢詩)의 멋> 雪後到乾明寺遂宿(설후도건명사수숙), 蘇東坡(소동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한시공방(漢詩工房)] <특집 : 소동파(蘇東坡)의 시로 맛보는 한시(漢詩)의 멋> 雪後到乾明寺遂宿(설후도건명사수숙), 蘇東坡(소동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261640.1.jpg)
![[한시공방(漢詩工房)] <특집 : 소동파(蘇東坡)의 시로 맛보는 한시(漢詩)의 멋> 雪後到乾明寺遂宿(설후도건명사수숙), 蘇東坡(소동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261639.1.jpg)
【소동파(蘇東坡)의 시로 맛보는 한시(漢詩)의 멋】
<전언(前言)>
중국 시의 관형어로 우리가 쉽사리 ‘당(唐)’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대(唐代)에 이백(李白)이나 두보(杜甫)와 같은 불세출의 대시인들이 끊임없이 출현한 때문이지만, 송대(宋代)의 송시(宋詩) 또한 그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중국 시 세계의 한 축이 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송대 최고의 시인이라 할 수 있는 소동파(蘇東坡)의 시를 통해 당시(唐詩)와는 또 다른 송시의 맛을 보며, 작은 기쁨에도 만족할 줄 알았던 시인의 따스한 품새를 느껴보도록 하자.
*****
겨울은 눈이 있어 비로소 공평한 계절이 된다. 옛사람들도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은 설원(雪原)을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사실은 아래에 소개할 소동파의 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 순백의 설원을 보며 옛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설원을 노래한 시를 통해 무슨 말을 들려주고자 했을까? 여기 소동파의 시가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雪後到乾明寺遂宿
(설후도건명사수숙)
門外山光馬亦驚(문외산광마역경)
階前屐齒我先行(계전극치아선행)
風花誤入長春苑(풍화오입장춘원)
雪月長臨不夜城(설월장림불야성)
未許牛羊傷至潔(미허우양상지결)
且看鴉雀弄新晴(차간아작롱신청)
更須攜被留僧榻(갱수휴피류승탑)
待聽摧檐瀉竹聲(대청최첨사죽성)
눈 내린 후에 건명사에 도착하여
마침내 유숙하고
문 밖 산 빛에
말 또한 놀랐는데
섬돌 앞에 나막신 자국 내며
내가 먼저 왔노라
바람결에 날리는 꽃이 장춘원에
잘못 들어온 듯하고
눈에 비치는 달빛이 오래 머물러
불야성이 되었구나
소와 양이 지극한 순결
상하게 하는 건 허락하지 않고
까마귀와 참새가 새로 갠 날
즐기는 건 또 보았노라
더욱이 이불 두르고
스님 걸상에 앉아
처마로 떨어지고 대나무에서 쏟아지는
눈 소리 들리길 기다렸노라
이 시는 소동파가 1081년에 유배지였던 황주(黃州:호북성)에서 지은 것이다. 그 해에 황주에는 대설이 내렸다고 한다. 제목에 보이는 건명사(乾明寺)는 황주의 황강(黃岡) 동쪽에 있었던 절 이름으로 소동파가 설경(雪景) 감상을 위해 일삼아 찾아간 곳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각 구절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제1구의 ‘門’은 소동파의 처소에 있는 문이 아닌 건명사의 산문(山門)을 가리킨다. “말 또한 놀랐다”는 표현은 설경의 의외성, 곧 설경이 더할 수 없이 빼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가 소동파의 독창인 것은 아니지만 직유(直喩)와 같은 비유보다는 훨씬 다양한 상상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제2구의 ‘섬돌’은 당연히 건명사 경내에 있는 사찰의 섬돌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산사(山寺)의 설경을 기뻐하여, 가마를 타거나 시종을 앞세우지 않고, 나막신 자국을 찍으며 직접 걸어서 섬돌 앞까지 이르렀다는 소동파의 기쁜 심사를 표현한 것이 된다.
제3구의 ‘風花’를 ‘바람결에 날리는 꽃’으로 번역하였지만 ‘바람과 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어떻게 보든 이 구절에서의 꽃은 눈을 비유한다. ‘장춘원(長春苑)’은 본래 황제의 궁원(宮苑)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건명사에 대한 비유어로 쓰였다. 제3구는 사찰 경내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리기도 하는 것을, 바람결에 꽃이 황제의 궁원에 잘못 들어온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제4구의 ‘雪月’을 오늘날 대부분의 판본(版本)에서는 ‘雲月’로 적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雲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사고전서본(四庫全書本) ≪동파전집(東坡全集)≫에서 ‘雪月’로 적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雪月’이 ‘雲月’보다 훨씬 더 시적이고 또한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건명사 경내를 불야성(不夜城)이 되게 하는 주체는 구름과 달이라기보다는 눈과 거기에 비친 달빛이기 때문이다.
제5구의 ‘至潔’ 또한 ‘風花’의 ‘花’와 마찬가지로 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구절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이 희디희게 쌓인 설원, 그 무한의 순수를 망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6구에 등장하는 까마귀와 참새는 가축과는 달리 통제 범위를 벗어난 야생의 날짐승이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눈 온 뒤’를 즐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감상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사실 이 시에서 까마귀와 참새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사찰 경내는 적막감이 감도는 을씨년스런 풍경이 되었을 것이다. 또 그 날짐승들은 소나 양처럼 설원에 난잡한 자국을 남기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통제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 설원 위를 나는 까마귀와 참새는 그야말로 동양화의 소품이 되어 화폭 안에 그대로 고정되고 있다.
제7구와 제8구는 눈 온 뒤에 즐긴 운치를 얘기한 것이다. 젊거나 어리다면 눈과 더불어 재미있게 놀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 만큼 든 어른들에게는 눈 온 뒤에 즐길 거리가 별로 없다. 소동파가 즐긴 것은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처마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와 대나무에서 쏟아지는 눈 ‘소리’였다. 그러한 소리는 더할 수 없는 고요 속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운치이다. 날이 차서 이불을 몸에 둘둘 말고 걸상에 앉아 그 ‘소리’를 감상하는, 중년을 훌쩍 넘긴 옛 시인의 모습이 먼 풍경처럼 아련하다.
선이 굵은 당시와는 달리 아기자기한 재미를 주는 이러한 시 한 수를 통하여 우리는, 소동파가 유배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뜻을 읽어낼 수 있다. 작은 기쁨에 만족할 줄 알고 이를 시로 읊을 줄 알았던 옛사람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꿈은 너무 뚱뚱하고, 뜻은 너무 높은 데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라도 어디 한적한 콘도에서 하룻밤쯤 머물며, 핸드폰 따위는 저만치 던져두고 나뭇가지에서 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설원을 날아가는 새들의 자취를 보며, 지친 영혼에 안식을 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소동파는 유배라는 아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여유를 즐기지 않았던가! 세상만사 모두가 다 마음먹기 나름이리라.
* 소동파(蘇東坡)는 송대(宋代)의 대문장가이자 대시인인 소식(蘇軾:1036~1101)을 가리키는데 ‘동파’는 그의 호이며 자는 자첨(子瞻), 시호(諡號)는 문충(文忠)이다. 아버지 소순(蘇洵), 동생 소철(蘇轍)과 더불어 삼부자(三父子)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로 추앙되었다. 철종(哲宗) 시기에 구법파(舊法派)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으며, 시와 문장은 물론 사(詞)와 서화(書畵)에도 매우 뛰어났다. 그의 문학(文學)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심대한 영향(影響)을 끼쳤다.
<전언(前言)>
중국 시의 관형어로 우리가 쉽사리 ‘당(唐)’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대(唐代)에 이백(李白)이나 두보(杜甫)와 같은 불세출의 대시인들이 끊임없이 출현한 때문이지만, 송대(宋代)의 송시(宋詩) 또한 그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중국 시 세계의 한 축이 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송대 최고의 시인이라 할 수 있는 소동파(蘇東坡)의 시를 통해 당시(唐詩)와는 또 다른 송시의 맛을 보며, 작은 기쁨에도 만족할 줄 알았던 시인의 따스한 품새를 느껴보도록 하자.
*****
겨울은 눈이 있어 비로소 공평한 계절이 된다. 옛사람들도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은 설원(雪原)을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사실은 아래에 소개할 소동파의 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 순백의 설원을 보며 옛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설원을 노래한 시를 통해 무슨 말을 들려주고자 했을까? 여기 소동파의 시가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雪後到乾明寺遂宿
(설후도건명사수숙)
門外山光馬亦驚(문외산광마역경)
階前屐齒我先行(계전극치아선행)
風花誤入長春苑(풍화오입장춘원)
雪月長臨不夜城(설월장림불야성)
未許牛羊傷至潔(미허우양상지결)
且看鴉雀弄新晴(차간아작롱신청)
更須攜被留僧榻(갱수휴피류승탑)
待聽摧檐瀉竹聲(대청최첨사죽성)
눈 내린 후에 건명사에 도착하여
마침내 유숙하고
문 밖 산 빛에
말 또한 놀랐는데
섬돌 앞에 나막신 자국 내며
내가 먼저 왔노라
바람결에 날리는 꽃이 장춘원에
잘못 들어온 듯하고
눈에 비치는 달빛이 오래 머물러
불야성이 되었구나
소와 양이 지극한 순결
상하게 하는 건 허락하지 않고
까마귀와 참새가 새로 갠 날
즐기는 건 또 보았노라
더욱이 이불 두르고
스님 걸상에 앉아
처마로 떨어지고 대나무에서 쏟아지는
눈 소리 들리길 기다렸노라
이 시는 소동파가 1081년에 유배지였던 황주(黃州:호북성)에서 지은 것이다. 그 해에 황주에는 대설이 내렸다고 한다. 제목에 보이는 건명사(乾明寺)는 황주의 황강(黃岡) 동쪽에 있었던 절 이름으로 소동파가 설경(雪景) 감상을 위해 일삼아 찾아간 곳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각 구절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제1구의 ‘門’은 소동파의 처소에 있는 문이 아닌 건명사의 산문(山門)을 가리킨다. “말 또한 놀랐다”는 표현은 설경의 의외성, 곧 설경이 더할 수 없이 빼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가 소동파의 독창인 것은 아니지만 직유(直喩)와 같은 비유보다는 훨씬 다양한 상상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제2구의 ‘섬돌’은 당연히 건명사 경내에 있는 사찰의 섬돌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산사(山寺)의 설경을 기뻐하여, 가마를 타거나 시종을 앞세우지 않고, 나막신 자국을 찍으며 직접 걸어서 섬돌 앞까지 이르렀다는 소동파의 기쁜 심사를 표현한 것이 된다.
제3구의 ‘風花’를 ‘바람결에 날리는 꽃’으로 번역하였지만 ‘바람과 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어떻게 보든 이 구절에서의 꽃은 눈을 비유한다. ‘장춘원(長春苑)’은 본래 황제의 궁원(宮苑)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건명사에 대한 비유어로 쓰였다. 제3구는 사찰 경내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리기도 하는 것을, 바람결에 꽃이 황제의 궁원에 잘못 들어온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제4구의 ‘雪月’을 오늘날 대부분의 판본(版本)에서는 ‘雲月’로 적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雲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사고전서본(四庫全書本) ≪동파전집(東坡全集)≫에서 ‘雪月’로 적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雪月’이 ‘雲月’보다 훨씬 더 시적이고 또한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건명사 경내를 불야성(不夜城)이 되게 하는 주체는 구름과 달이라기보다는 눈과 거기에 비친 달빛이기 때문이다.
제5구의 ‘至潔’ 또한 ‘風花’의 ‘花’와 마찬가지로 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구절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이 희디희게 쌓인 설원, 그 무한의 순수를 망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6구에 등장하는 까마귀와 참새는 가축과는 달리 통제 범위를 벗어난 야생의 날짐승이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눈 온 뒤’를 즐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감상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사실 이 시에서 까마귀와 참새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사찰 경내는 적막감이 감도는 을씨년스런 풍경이 되었을 것이다. 또 그 날짐승들은 소나 양처럼 설원에 난잡한 자국을 남기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통제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 설원 위를 나는 까마귀와 참새는 그야말로 동양화의 소품이 되어 화폭 안에 그대로 고정되고 있다.
제7구와 제8구는 눈 온 뒤에 즐긴 운치를 얘기한 것이다. 젊거나 어리다면 눈과 더불어 재미있게 놀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 만큼 든 어른들에게는 눈 온 뒤에 즐길 거리가 별로 없다. 소동파가 즐긴 것은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처마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와 대나무에서 쏟아지는 눈 ‘소리’였다. 그러한 소리는 더할 수 없는 고요 속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운치이다. 날이 차서 이불을 몸에 둘둘 말고 걸상에 앉아 그 ‘소리’를 감상하는, 중년을 훌쩍 넘긴 옛 시인의 모습이 먼 풍경처럼 아련하다.
선이 굵은 당시와는 달리 아기자기한 재미를 주는 이러한 시 한 수를 통하여 우리는, 소동파가 유배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뜻을 읽어낼 수 있다. 작은 기쁨에 만족할 줄 알고 이를 시로 읊을 줄 알았던 옛사람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꿈은 너무 뚱뚱하고, 뜻은 너무 높은 데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라도 어디 한적한 콘도에서 하룻밤쯤 머물며, 핸드폰 따위는 저만치 던져두고 나뭇가지에서 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설원을 날아가는 새들의 자취를 보며, 지친 영혼에 안식을 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소동파는 유배라는 아린 고통 속에서도 그런 여유를 즐기지 않았던가! 세상만사 모두가 다 마음먹기 나름이리라.
* 소동파(蘇東坡)는 송대(宋代)의 대문장가이자 대시인인 소식(蘇軾:1036~1101)을 가리키는데 ‘동파’는 그의 호이며 자는 자첨(子瞻), 시호(諡號)는 문충(文忠)이다. 아버지 소순(蘇洵), 동생 소철(蘇轍)과 더불어 삼부자(三父子)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로 추앙되었다. 철종(哲宗) 시기에 구법파(舊法派)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으며, 시와 문장은 물론 사(詞)와 서화(書畵)에도 매우 뛰어났다. 그의 문학(文學)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심대한 영향(影響)을 끼쳤다.
2023. 1. 3.
<한경닷컴 The Lifeist> 강성위(hanshi@naver.com)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한시공방(漢詩工房)] 서시, 나희덕](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4302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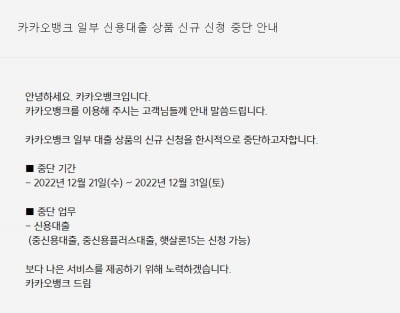
![[한시공방(漢詩工房)] 書鏡(서경), 李彦迪(이언적)](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029380.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