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장 반칸도 '구분점포' 등기됐다면 경매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우건설, 시행사 대신 갚은 400억 받으려
‘담보’ 양재 하이브랜드 점포들 처분 추진
매장 1/2칸‧3/4칸이 경매 가능한 지 ‘논란’
“경매 취소” 주장한 시행사가 1·2심서 승소
대법원, 원심 판단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경계표지 없었단 증명 못하는 한 독립된 점포”
‘담보’ 양재 하이브랜드 점포들 처분 추진
매장 1/2칸‧3/4칸이 경매 가능한 지 ‘논란’
“경매 취소” 주장한 시행사가 1·2심서 승소
대법원, 원심 판단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경계표지 없었단 증명 못하는 한 독립된 점포”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A 시행사의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4년여간 1·2심에서 거듭 패소했던 대우건설은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끝에 판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경매에 넘겨졌던 각 점포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구분 점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다”며 “경계표지 등이 설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점포들은 구분 건물로서 독립성을 갖췄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대우건설이 A 시행사를 대신해 갚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400억여원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5월 A 시행사가 담보로 제공했던 서울 양재동 상업용 건물 ‘하이브랜드’의 점포들을 경매에 넘기면서 비롯됐다. 1층 패션관에 있는 9개 점포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런데 각각의 점포가 독자적인 매장이 아니다보니 경매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점포 2개 혹은 3개가 주인이 다른 점포들과 따로 묶여 하나의 매장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점포 하나가 매장 4분의 3칸이나 반 칸인 셈이다. A 시행사는 “점포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소유권(구분 소유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7월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기둥이나 유리벽, 점포 출입문 등 다른 구역과 구분됐음을 보여주는 시설물이 있고 현황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건물 도면을 보면 각 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며 맞섰다. 현재 매장에서 이들 점포의 구획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 벽과 표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매장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경계 표지를 없앴지만 나중에 구분 점포로 복원할 것을 전제로 했던 일시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선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우건설이 경매를 통해 점포들을 처분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된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도 등기된 사실을 근거로 경매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점포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당초 경계선이 있던 지점에 페인트칠 흔적이 남았거나 타일이 당초 경계선대로 맞춰 깔려있다는 등 경계 복원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우건설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점포별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와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점포별 위치와 면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이 점포들을 쉽게 구분건물로 복원할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집합건축물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진 이상 경계 표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상업용 건물의 구분 점포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근저당권 등을 보유해 구분 점포를 처분하려는 쪽이 독립성을 입증해야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독립성이 없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해당 점포의 구분 소유권인 인정돼서다. 부동산업계에선 특히 경매시장에 나오는 오픈상가 점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많이 떨어진 아파트에 주목하세요"…부동산에도 '기저효과' [심형석의 부동산정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99.199892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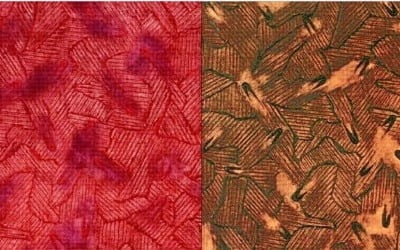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