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써내려간 SF…소설로 쓴 시대의 그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희선 소설집 <빛과 영원의 시계방>
소설가 김희선(51)은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에 선 작가다. 젊은작가상을 받았고 이상문학상과 현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의 본심에 여러 차례 올랐지만 그의 작품엔 외계인이라든가 평행 우주, 시공간 같은 소재가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
그가 최근 펴낸 세 번째 소설집 <빛과 영원의 시계방>(허블)도 그렇다. 시간 여행, 마인드 업로딩, 시뮬레이션 우주, 인공지능 등이 등장한다. 공상과학소설(SF)을 표방하지만 사색적이며, 현실의 사회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구석이 많다. 책에 담긴 8개의 단편을 감싸는 기이한 이야기는 일본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첫 작품 ‘공간 서점’은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아들의 편지를 받은 사설탐정의 이야기다. 시계방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누군가에게 쫓겨 가게로 들어온 청년으로부터 어떤 장치를 만드는 법에 관한 책을 건네받는다. 그 청년은 가게를 나선 뒤 최루탄 파편에 맞아 죽고, 아버지는 그 후 책에 나온 장치를 만들어보기로 한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사라지고, 시계방이 있던 자리에 한 남자가 ‘공간 서점’이란 중고 책방을 연다. 책방 주인은 사설탐정에게 말한다. “혹시 세상에 길은 한 갈래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을 멈추다’는 생존을 위협받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컴퓨터 저장장치로 옮기는 마인드 업로드에 나선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애도하는 성격이 강한 소설이다.
구글의 초인공지능에 잘못 입력된 명령어로 배달노동자들이 무한히 복제되는 내용을 다룬 ‘끝없는 우편배달부’는 배달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비튼 작품이다. ‘가깝게 우리는’은 노동권을 위해 투쟁하던 사람들을 모두 자동인형으로 교체하려는 정부의 음모를 파헤친다.
강원 원주에 살고 있는 작가의 본업은 약사다. 병원 약사로 일하며 퇴근 후 1~2시간씩 소설을 쓰고 있다. ‘로보캅’을 본 뒤 로봇을 만들고 싶어 고등학교 이과를 선택한 특이한 이력의 작가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정교함과 정확함은 작품 전반에서 발견되는 미덕이다. 작가가 숨겨놓은 복선을 찾으면서 읽는 것도 이 책의 묘미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그가 최근 펴낸 세 번째 소설집 <빛과 영원의 시계방>(허블)도 그렇다. 시간 여행, 마인드 업로딩, 시뮬레이션 우주, 인공지능 등이 등장한다. 공상과학소설(SF)을 표방하지만 사색적이며, 현실의 사회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구석이 많다. 책에 담긴 8개의 단편을 감싸는 기이한 이야기는 일본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첫 작품 ‘공간 서점’은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아들의 편지를 받은 사설탐정의 이야기다. 시계방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누군가에게 쫓겨 가게로 들어온 청년으로부터 어떤 장치를 만드는 법에 관한 책을 건네받는다. 그 청년은 가게를 나선 뒤 최루탄 파편에 맞아 죽고, 아버지는 그 후 책에 나온 장치를 만들어보기로 한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사라지고, 시계방이 있던 자리에 한 남자가 ‘공간 서점’이란 중고 책방을 연다. 책방 주인은 사설탐정에게 말한다. “혹시 세상에 길은 한 갈래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을 멈추다’는 생존을 위협받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컴퓨터 저장장치로 옮기는 마인드 업로드에 나선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애도하는 성격이 강한 소설이다.
구글의 초인공지능에 잘못 입력된 명령어로 배달노동자들이 무한히 복제되는 내용을 다룬 ‘끝없는 우편배달부’는 배달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비튼 작품이다. ‘가깝게 우리는’은 노동권을 위해 투쟁하던 사람들을 모두 자동인형으로 교체하려는 정부의 음모를 파헤친다.
강원 원주에 살고 있는 작가의 본업은 약사다. 병원 약사로 일하며 퇴근 후 1~2시간씩 소설을 쓰고 있다. ‘로보캅’을 본 뒤 로봇을 만들고 싶어 고등학교 이과를 선택한 특이한 이력의 작가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정교함과 정확함은 작품 전반에서 발견되는 미덕이다. 작가가 숨겨놓은 복선을 찾으면서 읽는 것도 이 책의 묘미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무관의 제왕'이 피아노로 들려준 베토벤의 고통과 희망 [클래식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2765919.3.jpg)
![[이 아침의 소설가] 6·25 전쟁고아 지원 한국을 사랑한 펄 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AA.3275861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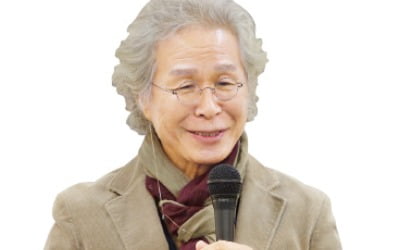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