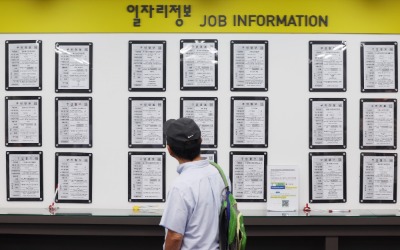중국 부추 투자자는 올해도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초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연내 4000선을 넘을 수 있다는 장밋빛 시나리오를 내밀었다. 2015년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한 4000선이다. 상하이증시는 1월 5%가량 올랐다가 2월부터 다시 33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사라진 양회 랠리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전후해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뛰던 ‘양회 랠리’도 옛말이 됐다. 중국공산당이 ‘공동부유’를 전면에 내건 이후 중국 증시는 상승 동력을 상실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국가가 밀어준다는 첨단기술주도 이슈가 나올 때 반짝 올랐다가 곧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 국무원(행정부)이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에서 내놓은 ‘5% 안팎’ 성장률 목표를 보더라도 올해 증시 급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많다. 규제 완화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 6% 이상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지속하면서 5% 성장에 만족할 것인지의 기로에서 중국 지도부가 후자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 첫해에 고성장 대신 부채 감축과 국유기업 개혁 등 해묵은 과제들을 다시 꺼내든 건 맞는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반등이 예상만 못해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시 주석의 ‘예스맨’들로 채워진 지도부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계획을 밀고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이 성장률 5%를 제시한 배경에는 내년 이후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수 국제기구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5% 이상을 달성한 뒤 내년에는 4%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부채 부담에 따른 인프라 투자 여력 축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정책 신뢰 상실한 중국
중국 증시 반등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추락이다. 이런 신뢰 저하가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 기업과 중국 국민에게까지 확산했다는 점은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번 국무원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해외 투자자 유치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행보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자국 국유기업에 세계 4대 회계법인과의 감사 계약을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융계 유명 인사가 당국의 조사를 받느라 돌연 종적을 감춘 사건도 있었다.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규제를 풀고 있다는 신호도 나왔지만, 이번 전인대와 정협 위원 명단에선 대표 빅테크인 텐센트, 알리바바, 넷이즈 등의 경영자가 대거 사라졌다. 정치적 통제를 이어갈 것이란 신호로 해석된다.
양회에서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국무원이 정작 발표한 것은 부동산 영역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감독 강화였다. 중국 부추는 언제쯤 수시로 머리가 깎이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특파원 칼럼] 분열의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7.19613731.3.jpg)
![[특파원 칼럼] 불완전한 챗GPT, 규제도 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7.30741233.3.jpg)
![[특파원 칼럼] 헝그리정신 없이는 구글도 망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7.27489770.3.jpg)
![[단독] "손 꼭 잡고 다니던 부부"…알고보니 100억 사기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906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