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물 곳 없대서 원룸 내줬더니…쓰레기장 만들고 잠적한 직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은 소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가게 매니저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던 중 착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30대 초반의 남자 매니저를 채용했다"며 "(직원 B씨가) 당장 머물 곳이 없어서 원룸을 내 명의로 임대해 빌려주고, 1년 동안 같이 일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B씨는) 처음에 열심히 하더니, 가게를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해서 늘 지적해야만 했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지난달 일을 관두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룸 계약서를 매니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고, 며칠 뒤 만나자고 (만날) 날짜까지 약속했다"면서도 "그 뒤로 연락 두절이 됐다. 알고 보니 (빌려준) 집을 쓰레기 집으로 만들고 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모든 공과금은 미납된 데다, (오히려) 저한테 원룸 시설보수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왔다"며 "TV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 했고, 너무 황당하고 배신감이 느껴진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 믿고 잘해준 내가 너무 한심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은혜를 쓰레기로 갚은 것이냐", "꼭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난장판을 해 놓을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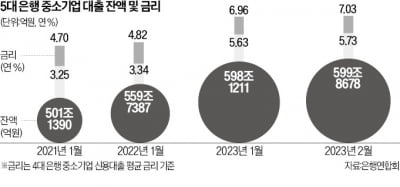
![소상공인의 안전벨트, '노란우산공제' 활용법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155677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