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리 제이미슨 지음
오숙은 옮김
<공감 연습> (문학과지성사, 2019)
“여러분의 글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두지 말고, 무엇보다도 죽지 마세요. 정 죽어야 한다면 자살하세요. 저들도 자살은 괜찮다고 여기니까요.”⑴어슐러 K. 르 귄은 1986년 열린 ‘2000년도의 여자들’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그로부터 몇 년 뒤 아베체데(ABCD)도 모르고 들어간 대학 강의실에서 “독일 작가나 독문학자 글 중에 읽어본 거 있는 사람?”이라고 물은 교수가 우리의 무응답을 지루해하는 기색에 전혜린이라는 이름을 댔다가 면박을 당한 적이 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지었던 표정은 물론, 했던 말도 기억난다. “아직도 전혜린을 읽는다고? 언제 적 전혜린이냐…… 지겹지도 않냐.” 그는 전혜린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더 오래 회자된 작가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저자는 고백한다. “나는 여성의 고통이 지긋지긋하지만, 그것을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기도 하다. 나는 아파하는 여성이 하나의 클리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수많은 여성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나는 여성의 상처란 낡아버린 것이라는 명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주장에 내가 상처받는 기분이니까.”⑵
당연하다. 공동의 상처는 시대 안에서 축적되더라도 개인들의 상처는 언제나 그만의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중이며 결코 낡는 법이 없으니까. '여성 고통의 대통일 이론'이라는 제목의 이 에세이는 <공감 연습>이라는 책에 실려 있다.
왜 어떤 이야기는 아무리 반복돼도 거듭나고 또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서사의 중심이 되고, 다른 이야기는 해묵고 물려서 그만 좀 들었으면 싶은 타령이 될까? 이 책은 공감하는 법을 말하기보다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인지를 이야기한다. 이해하고 이해받기, 서로의 존재를 지우지 않고 가능성을 교환하기가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인지를.

그가 온갖 붕괴와 고통과 상처에 대한 공감 연습의 막바지에 앞의 글을 배치했다는 점, 이 책의 원제가 'The Empathy Exams'이라는 점은 우리가 공감하지 않으려는 것 앞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공감 중단을 지성의 피로로 가장하기는 쉽다.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한다. “우리는 용기가 있기에 공감할 수도 있다. 그 점이 핵심이다.” ⑶
⑴ 어슐러 K. 르 귄, <세상 끝에서 춤추다>, 이수현 옮김, 황금가지, 2021, pp. 312-313.
⑵ 레슬리 제이미슨, <공감 연습>, 오숙은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9, p.329.
⑶ 위의 책, pp. 4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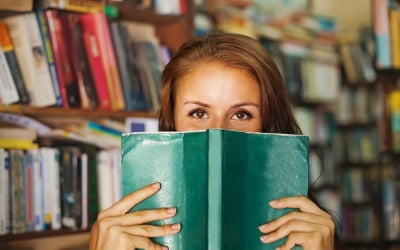
!['노동절' 아침에 출퇴근을 사유하다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314799.3.jpg)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고두현의 인생명언]](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31204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