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롤리타"…12살 소녀에 반해 엄마와 결혼한 남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구은서의 이유 있는 고전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소녀의 엄마는 우연히 남자의 일기를 본 뒤 그 속셈을 알아차립니다. 피가 꺼꾸로 솟았겠죠. 그녀는 격분해 집을 뛰쳐나갔다가 차에 치여 죽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의붓딸인 소녀를 연인처럼 대하며 함께 전국의 모텔을 떠돕니다. 이 얘기는 남자가 훗날 살인을 저지르면서 드러납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신문 사회면에서 수갑을 찬 이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혹은 1면에서.
그러니 1955년 출간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를 ‘고전’이라 칭송할 필요가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4월 22일이 나보코프 탄생일이든 말든. 소아성애증을 뜻하는 ‘롤리타 콤플렉스’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소설을 읽어야 하냐고 말이죠.
물론, 유명한 책이라고 반드시 읽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문학은 늘 금기를 다뤘어요. 금기를 깨며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도 많고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단순하게 말해 '살인범 이야기'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는 불륜 얘기죠.
이 충격적 이야기를 통해 독자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느 드라마에서 울부짖었듯이 주인공 험버트 험버트는 자신의 행위를 '사랑'으로 합리화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버리고 만 한 남자의 고단한 인생으로 소설을 독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설 속에서 험버트는 어린 시절 첫사랑이 병으로 떠난 뒤 그 또래의 여자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반면 2부에서 소설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1부에서 험버트는 아름다운 언어로 자신의 욕망을 옹호합니다. 어찌나 유려한지 그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욕망의 대상이었던 롤리타가 2부에서 "더러운 생활"을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연극의 막이 내려집니다.
탈출에 성공한 롤리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요. 험버트로 인해 교육의 기회조차 뺏긴 롤리타. 그녀는 가난에 시달리던 중에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납니다. 롤리타를 “어리지만, 발칙한 것” 취급하던 험버트는 그제야 롤리타에게 “더러운 정욕의 상처”를 입혔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소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가짜 해설서’를 붙여놓았습니다.
“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롤-리-타. 혀끝이 입천장을 따라 세 걸음 걷다가 세 걸음째에 앞니를 가볍게 건드린다. 롤. 리. 타.” 한 번 읽으면 잊을 수 없는 구절로 널리 알려진 소설 도입부는 사실 첫 문장이 아닙니다.
가짜 해설서는 험버트가 감옥에서 죽기 전 ‘롤리타’라는 제목의 고백록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정신분석학자 존 레이 주니어 박사의 글입니다. 허구의 인물인 박사는 나보코프를 대신해 말합니다.
“‘불쾌하다’는 말은 ‘독특하다’라는 말의 동의어인 경우가 종종 있으며, 위대한 예술작품은 모두 독창적이고, 바로 그러한 본질 때문에 크든 작든 충격적인 놀라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서둘러 덧붙입니다. “험버트가 잔혹하고 비열한 인물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소설의 끝부분에서 험버트는 자신과 꼭 닮은 소아성애자 극작가 퀼티를 죽입니다. 그 죄로 독방에 갇힌 채 죽어갑니다.
나보코프는 '식물원 쇠창살에 갇힌 유인원'을 보고 이 소설을 구상했다고 밝힌 적이 있죠. 그의 눈에 비친 유인원은 롤리타일까요, 험버트일까요.
"나의 롤리타." 험버트의 마지막 말은 사랑과 폭력의 차이에 대한 오랜 질문을 던집니다. 롤리타의 서류상 이름은 돌로레스. 스페인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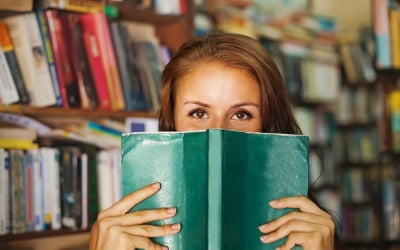
!['노동절' 아침에 출퇴근을 사유하다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314799.3.jpg)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고두현의 인생명언]](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312049.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