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 크리우스 지음
장호연 옮김
위즈덤하우스
464쪽│2만2000원

회의시간에 눈은 똑바로 뜨고 있지만 상사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있는 후배,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귀를 가린 머리칼을 들춰보자 이어폰을 끼고 유행가를 듣고 있는 직원…. 그렇다. 눈만으로는 부족하다.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파악하려면 귀를 알아야 한다.
최근 출간된 <소리의 마음들>은 소리와 그것을 이해하는 뇌에 대한 책이다. 소리가 뇌에 행사하는 영향력도 다룬다. 책은 "삶의 소리들이 우리 뇌의 모습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저자 니나 크라우스는 30년 넘게 소리와 청각을 연구해온 신경과학자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대학 신경생물학·의사소통과학·이비인후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소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여서 음악을 들으며 자랐고, 어린시절 뉴욕과 어머니의 고향인 이탈리아 트레에스테를 오간 덕에 두 가지 언어에 노출돼있던 영향이 크다. 그야말로 그가 들어온 소리들이 그의 삶을 만든 셈이다. 책은 크라우스가 평생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첫 책이다.
소리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눈을 감을 수는 있어도 귀를 닫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청각은 늘 스위치가 켜져 있다. 심지어 눈을 감고 잘 때조차. 세상은 음소거가 되지 않는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문 바깥에서 차가 돌아다니는 소리, 내가 움직이고 숨쉬고 소화시키느라 내는 소리가 늘 있다. 집 안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 순간에도 소리는 언제나 우리의 귀를 맴돈다.
청각과 관련된 뇌 활동은 엄청난 속도로 이뤄진다. '소리'와 '소라'. 1초도 안 걸리는 단 하나의 음소 차이를 인간은 바로 알아차린다. 책은 이렇게 설명한다. "청각뉴런은 1000분의 1초 만에 계산을 해낸다. 빛은 소리보다 빠르지만 뇌에서는 청각이 시각보다, 다른 어떤 감각보다 더 빠르다."
소리를 지각하는 능력은 오랜 기간 생존을 좌우했다. 모든 척추동물에는 청각 기제가 있다. 일부 두더지와 양서류, 어류 등 시각 능력이 없는 척추동물은 많다.
"소리 지각은 포식자나 다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도로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일으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먼 선조들이 산사태나 동물의 대이동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소음에 반응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언어, 리듬, 소음 등 다양한 소리가 어떻게 뇌, 신체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사례가 흥미롭게 이어진다. 예컨대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가르랑거리지만, 다쳤을 때도 가르랑거린다.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진동 주파수는 뼈를 성장시키는 진동 치료에 사용하는 주파수 범위와 같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양이가 스스로 뼈와 근육을 자극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가설이 나왔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면 고양이가 개보다 뼈가 건강하고 골다공증 발생이 드문 게 우연이 아니라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굳이 옥의 티를 찾자면 저자가 주창하는 '소리 마음(sound mind)'란 개념이 분명하지 않는다는 것. 소리가 뇌에 행하는 작용들을 저자 나름대로 개념화한 것인데, 너무나 다양한 작동을 '소리 마음'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서 뜻이 분명하게 와닿지 못한다.
'행하다' 자체가 원체 많은 동사를 퉁친 표현이다. 이 책의 행운은 미학과 음악학을 전공한 장호연 번역가라는 훌륭한 길잡이를 만난 것. 그가 책을 해설한 '옮긴이의 말'이 책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이 글부터 읽은 뒤에 본문을 읽기를 권하고 싶을 정도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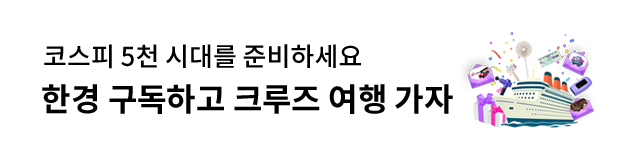

![그는 왜 어머니를 ‘꽃장’으로 모셨을까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1.4222777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