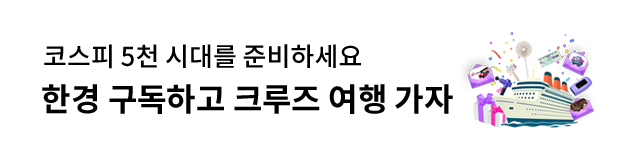대법, 일부 승소 2심 파기환송
불법 몰랐을땐 별도소송 내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권 매수자 A씨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통해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이탈주민인 B씨는 2018년 자신의 주택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넘겨 경기 용인 성복역 롯데캐슬파크나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9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B씨의 분양권을 샀다. 이후 B씨의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났고 시행사는 공급계약을 취소했다. 시행사는 계약금과 1회차 중도금을 포함한 1억1700여만원 중 중도금 5750만원만 A씨가 대출받은 은행에 반환했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6000여만원은 위약금으로 가져갔다. A씨는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약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조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A씨는 계약금을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다만 시행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A씨의 소송 취지와 달리 불법 청약임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2021년 3월 주택법 개정으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주택 또는 입주자 지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소명한 매수인은 계약 취소를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분양권 매입 계약 단계에 주택 매매거래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거래대금 내역 등을 잘 챙겨 보관하고 있어야 원활한 소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