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악 '8중주 오딧세이'라는 거대한 도전 [클래식 리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7일 폐막 공연
전체 레퍼토리 '8중주 편성 실내악'으로
라프의 현악 8중주…불안 호흡·산만한 인상 남겨
호프만 작품서 만회…긴밀한 호흡·입체적 음향
강동석의 노련한 리더십, 유려한 음색 두드러져
전체 레퍼토리 '8중주 편성 실내악'으로
라프의 현악 8중주…불안 호흡·산만한 인상 남겨
호프만 작품서 만회…긴밀한 호흡·입체적 음향
강동석의 노련한 리더십, 유려한 음색 두드러져

오후 2시. 호르니스트 에르베 줄랭의 짧은 ‘알프호른’(알프스 지역 목동들이 불던 원뿔형의 긴 관악기) 팡파레 연주로 문을 연 공연의 첫 실내악 작품은 요아힘 라프의 '현악 8중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을 필두로 조가현·양정윤·안희전(바이올린), 김상진·서수민(비올라), 강승민·이상은(첼로)의 연주였다.
유럽 등지에서도 근래에야 조명한 생소한 작품을 국내 청중에게 선보인다는 취지는 좋았다. 다만 전체적인 호흡에서 매끄럽지 않은 면들이 드러났고 각 악곡의 악상이 다소 흐릿하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예민한 리듬 표현과 강렬한 악상이 살아나야 하는 1악장에서는 제1바이올린을 중심으로 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산만한 인상을 남겼고, 2악장 스케르초(빠른 3박자로 익살스러움을 표현하는 악곡 형식)에서는 짧은 음형의 주제 선율이 악기별로 겹겹이 층을 이루며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부족했다.
같은 음형을 표현하는 연주법이 통일되지 않으면서 소리가 어긋나는 구간들도 여러 차례 생겨났다. 짧은 음표로 이뤄진 악구를 빠르게 연주해야 하는 4악장에서는 각 악기가 다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리듬이 엉키거나 선율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더러 있었다.

이들은 시작부터 꿰맞춘 듯한 세기와 밀도, 같은 길이의 음형과 속도로 선율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한 몸처럼 긴밀한 호흡을 선보였다. 그러자 악곡 특유의 생동감과 목가적인 서정성이 살아났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소리를 키운 것이 아니라 각 악기군의 음색을 켜켜이 포개가며 만들어내는 응축된 에너지와 풍성한 색채, 강한 추진력은 전체 악곡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전경에 자리할 때 또렷한 음색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다가도 금세 소리를 줄여 기꺼이 후경으로 빠지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면밀한 앙상블은 입체적인 음향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3악장에서는 작은 아티큘레이션(각 음을 분명하게 연주하는 기법) 하나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2박자의 경쾌한 춤곡의 맛을 살려냈고, 4악장에선 빠른 진행에서 중요 음을 정확히 짚어내면서 재치 넘치는 악곡의 매력을 펼쳐냈다.

1악장에서는 강한 추진력으로 악곡 특유의 시원하면서도 장대한 악상을 표현해냈고, 2악장에서는 첼로와 비올라의 두꺼운 울림 위로 열정적인 색채의 바이올린 선율을 채워 넣으면서 신비로우면서도 고풍스러운 악상을 드러냈다.
다만 3악장 스케르초부터 여덟 악기의 음향적 밀도, 리듬의 치밀함이 흔들리면서 실내악 고유의 견고한 짜임새와 교향곡에 비견할 만한 광활한 악상을 표현하는 데 빈틈이 생겨났다. 멘델스존의 탁월한 대위법 역량이 담긴 4악장에서는 작품의 전경과 후경을 담당하는 악기군의 대비와 악상의 강약 차이가 다소 옅게 표현되면서 평면적인 인상을 남겼다.
이날 공연만 보자면 ‘완벽한 앙상블’이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청중에게 낯선 편성의 실내악 작품을 선보이고, 더 많은 연주자가 실내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새로운 호흡에 도전하도록 하는 일은 분명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미래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이들의 발걸음을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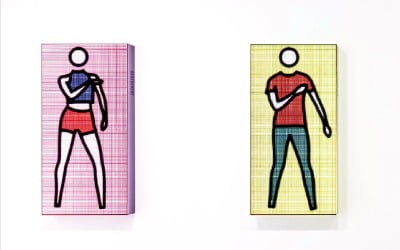
![[연극 리뷰] 국립극단 '벚꽃동산', 한심하고 우스운 '몰락 귀족'…그 뒤에 숨겨진 불안과 아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516810.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