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부를 성모 마리아로 그린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책마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술관에서 만난 범죄 이야기
이미경 지음
드루
384쪽|2만2000원
이미경 지음
드루
384쪽|2만2000원
![매춘부를 성모 마리아로 그린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02479.1.jpg)
<미술관에서 만난 범죄 이야기>는 이 같은 범죄를 서양 미술사에서 한 획을 그은 명화들을 통해 들여다본다. 책 제목만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자극적인 소재로 이목을 끌려는 책이 아닐까’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걱정은 책을 읽어가면서 잦아든다.
저자 이미경은 미술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추하지만 인정해야 하는 우리 삶의 어두운 이면, 이제는 미술 속에 드러난 불편한 범죄 이야기를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고 했다.
서양 미술에서 화가들이 매춘부를 모델로 고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작가들은 매춘부를 모델로 성모 마리아, 비너스와 같은 성스러운 이미지를 그렸다. 이런 관행은 1863년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매춘부 올랭피아를 ‘매춘부 올랭피아’로 그렸기 때문이었다.
당시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민낯이 미술관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부르주아들은 매춘부를 천하게 여겼지만 실제로는 매춘부와 정을 통하는 일이 많았다. 사람들은 살롱에 걸린 ‘올랭피아’를 향해 지팡이를 콕콕 쑤시며 어떻게 이 천하고 상스러운 그림을 전시할 수 있냐고 비난했다.
‘올랭피아’는 근대 시민의 현재와 그들의 삶을 거울처럼 똑같이 비춘 것으로, 위선으로 포장된 미술이 아닌 솔직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마네의 성명서였다. 오늘날 ‘올랭피아’는 서양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에드가 드가의 1874년 작품 <무대 위의 발레 리허설>은 어린 발레리나들이 무대 위에서 리허설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양복 입은 남성이 보인다. 책은 “실크 모자를 쓴 남성은 검은색 초크를 하지 않은 발레리나 가운데 마음에 드는 소녀 하나를 골라 값을 치르고 자신의 거처로 데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매수였다. 목에 검은색 초크를 두른 발레리나는 이미 후원하는 귀족을 두고 있다는 표시였다.
파블로 피카소의 1907년 작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원래 피카소가 ‘아비뇽의 매음굴’로 이름 붙이려 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아비뇽 거리는 오랜 항해에 치진 선원들이 성적 욕망을 푸는 곳이었다. 그림엔 욕망과 함께 무서운 성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나타난다.
살인은 새삼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롯해 각종 전쟁 이야기 등 살인은 늘 있었고, 그림에도 나타났다. 하지만 살인자가 그린 그림이 있다면 섬뜩하지 않을까. 카라바조가 1607년 그린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 그런 예다. 골리앗의 머리를 꽉 움켜쥔 다윗의 왼손과 칼을 들어 올린 오른손에서 아직 식지 않은 다윗의 살기를 느낄 수 있다.
카라바조는 20대 후반부터 감옥을 제집처럼 들락거렸다. 그의 범죄는 말다툼, 모욕, 명예훼손, 사기에서 폭력, 강도, 살인으로 점점 강력해졌다. 쫓기는 범죄자 신분으로도 그가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강력한 후원자의 묵인, 방조, 도움 덕분이었다.
책에 소개된 그림은 대부분 유럽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이라고 한다. 왜 이런 폭력적이고, 섬뜩한 그림들을 걸어 놓았을까. 미술의 본질이 아름다운 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여주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 책도 그런 효과를 낸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부자가 되는 한방은 없다"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1960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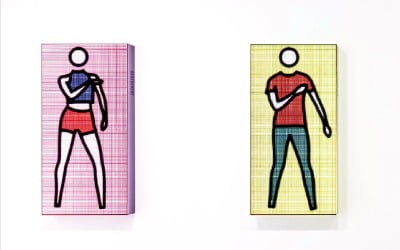
![[연극 리뷰] 국립극단 '벚꽃동산', 한심하고 우스운 '몰락 귀족'…그 뒤에 숨겨진 불안과 아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516810.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