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소중해, 소설 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rte] 박선우의 탐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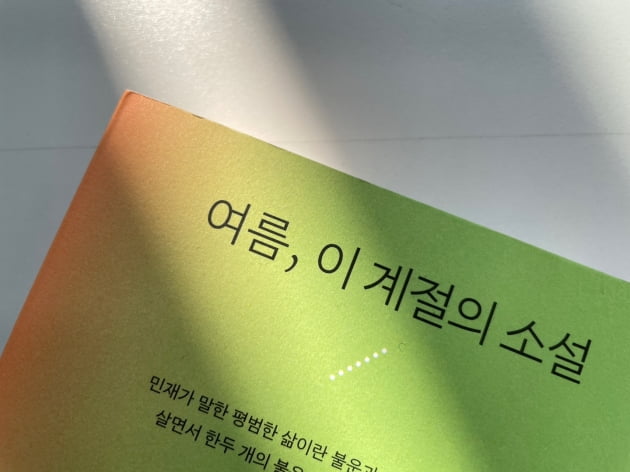
나는 작은 책을 좋아한다. 작으면 가볍고, 가벼우면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소지하기 용이하면 지척에 있기 마련이고, 출퇴근길이나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무시로 꺼내 한 단락이라도 읽게 되니까. 한 단락이 쌓이고 쌓이면 한 페이지가 되고(가끔은 기다리는 이가 늦는 게 반갑기도 하다), 그렇게 페이지들이 넘어가다 보면 어느덧 한 꼭지를 읽게 된다. 그런 나날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한 권의 책을 완독할 수 있다. 이른바 티끌 모아 태산(너무 거창한가) 독서법인데, 이것은 내가 직장을 다니게 된 이후로 책을 읽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소설 보다>를 좋아한다. 햇빛이 뜨거워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에코백을 메고 다니는 시기에 이르면 더욱 그렇다. 그뿐일까. “계절의 리듬에 따라, 젊고 개성 넘치는 한국 문학을 가장 빠르게 소개”하겠다는 취지처럼 바로 지난 계절에 발표된 단편소설들 중 흥미로운 작품들을 선정한 책이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작품 말미에 해당 작가와의 짧은 인터뷰가 실린 구성도 바람직하다. 방금 읽은 소설의 여운이 잔잔히 이어지면서도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작품을 집필하던 시기의 경험이나 꿈, 컨디션, 감정 같은 것들을 접하는 일이 독서 체험을 한결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는 책을 읽는 과정보다 책을 덮고 난 직후의 몇 초(드물게는 몇 분)을 위해 책을 읽는 것만 같다.
사실 <소설 보다>는 내가 이전 회사에서 처음 기획한 책이기도 하다. 기획이라 하기에는 조금 머쓱한 것이 기존의 <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을 4등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전해 받고 이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의 대학원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문예창작을 공부하던 시기에 계절마다 출간되는 문예지들을 전부 살펴보기 버거웠던 나는 늘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근래 발표된 소설 중 무엇이 가장 좋았느냐고 묻곤 했다. 도서관에서 그것들을 찾아 일일이 복사한 뒤 반으로 접어 가지고 다니며 읽었다. 그때마다 나는 이 과정을 누군가 대신해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러한 결과물이 작고 가벼우면서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많은 이에게(특히 학생들에게) 전해졌으면 하고 바랐다(물론 이러한 회상은 내가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지난날을 당장의 필요에 맞게 재정립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렴 어떨까).
결과적으로 <소설 보다>는 단행본 시리즈로서 안착했고, 지금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3500원이라는 가격은 온라인 서점의 무료 배송 가격이 1만5000원으로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읽고 싶은 책을 한 권만 구매하는 것으로는 1만5000원을 넘기기 어려울 때 <소설 보다>를 추가하면 되니까. 이는 애초에 수익률보다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보급률에 중점을 둔 가격 책정이 세월의 흐름에도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소설 보다>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한때는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의 판매 지수를 뛰어넘길 바라기도 했지만…. 이제는 계절마다 꾸준히 출간되어 내 가방 속에 폭 담기는 것만으로 족하다. 휴대전화와 에어팟, 카드 지갑 그리고 <소설 보다>만 챙겨 가볍게 외출하고 싶은 여름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