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색화 잇는 '한국 대표 미술'...실험미술을 만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 전시
김구림 이건용 등 29명 작가 95점 전시
특유의 에너지와 독창성으로 해외서도 인기
9월부터 구겐하임미술관 등 미국에서 순차 전시
김구림 이건용 등 29명 작가 95점 전시
특유의 에너지와 독창성으로 해외서도 인기
9월부터 구겐하임미술관 등 미국에서 순차 전시

1976년 3월 국내 미술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청년 작가들의 ‘실험미술’이 사회 질서를 해치고 퇴폐적이니 전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발신자는 국립현대미술관. 노골적인 문화 검열이자 탄압이었지만, 일반인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실험미술가들의 활동은 신문 문화면에 나오는 예술이 아닌 사회면에 나오는 ‘사건·사고’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47년이 지난 5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대규모 전시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가 개막했다. 실험미술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이렇게 날아갔다. 게다가 이번 전시는 세계 최고 미술관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이 공동 기획했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폐막한 뒤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리고, 2월부터 5월까지는 LA해머미술관에서 순회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십년 전 한국에서 유행했던 난해한 미술 사조를 해외의 세계적인 미술관들까지 재조명하는 이유를 들여다보자.
단색화 이은 ‘한국 미술 대표 브랜드’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 작가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백남준과 이우환을 비롯해 김수자·서도호·양혜규·이불·전광영 등 두 손이 모자랄 정도다.하지만 해외에 알려진 한국의 ‘미술 사조’를 대라면 딱 하나밖에 없다. 2010년 이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단색화다. 윤형근·박서보·정상화 등이 이 사조에 속하는 거장들이다.
실험미술은 단색화의 뒤를 이을 유력한 다음 타자로 꼽힌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실험미술은 한국 미술계의 ‘대세’였다.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0년대 후반부터다. 이건용·이강소·이승택· 김구림 등 실험미술 대가들의 작품은 수억원대를 호가하며 해외 컬렉터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전시장에 나온 이건용의 ‘신체항 71-73’이 이 때 출품됐던 작품이다. 흙으로 된 육면체 형태의 받침대에 나무를 뿌리째 심은 형태로, 난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상징한다.
수십년 터울 넘어 세계로

하종현과 서승원은 실험미술과 단색화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금 단색화 거장으로 분류되는 이 작가들은 한때 실험 미술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전시장에 나와 있는 하종현의 ‘도시 계획 백서’(1967), 서승원의 ‘동시성 67-1’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험미술의 전성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정부의 검열이 계기였다. 1980년대 이후에도 단색화와 민중 미술에 밀려 비주류로 남았다. 퍼포먼스나 설치작품이 많고 난해한 특성상 작품을 팔기도 어려웠다. 많은 작가들이 생활고에 시달렸고 정신 질환을 겪거나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았다. 학계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였고, 시장에서 빛을 본 건 그로부터 20년이나 흐른 뒤였다.

참여 작가 수가 29명, 작품 수는 95점에 달하는 데다 하나 같이 ‘사연 있는 작품’ 들이라 도록을 쭉 읽은 다음 전시를 감상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논문과 당시 주요 비평글, 선언문 등이 국·영문으로 총망라돼 있다. 국문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영문판은 구겐하임미술관이 각각 편집을 맡았다.
전시 기간 중 실험미술을 대표하는 퍼포먼스인 김구림의 ‘생성에서 소멸로’(6월 14일), 성능경의 ‘신문읽기’(6월 21일), 이건용의 ‘달팽이 걸음’(6월 28일) 등 재현 작업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전시는 7월16일까지.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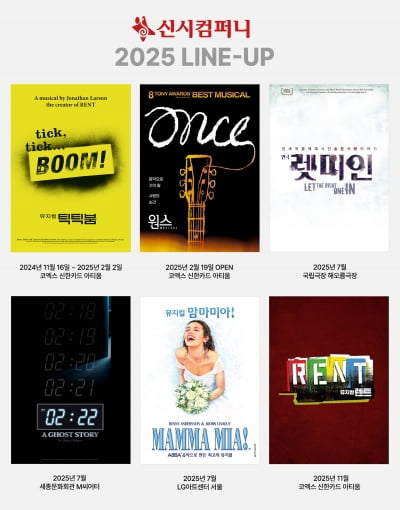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