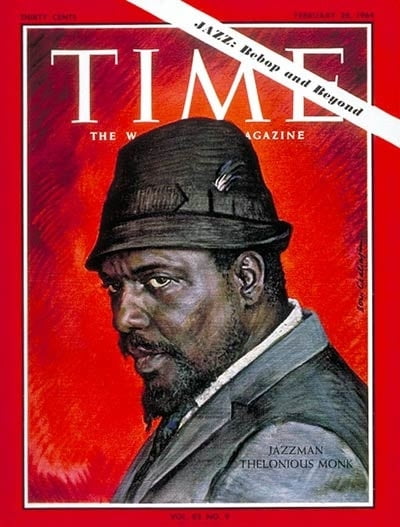'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말을 들으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rte] 이재현의 탐나는 책(3)
<강물에 떠내려가는 7인의 사무라이>
정영문 지음
워크룸프레스
<강물에 떠내려가는 7인의 사무라이>
정영문 지음
워크룸프레스

나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소설을 읽으며 말 그대로 웃음이 비어져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오래 진지하게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핑 감돌고, 크게 감탄해 급히 밑줄을 긋는다. 동의와 분노, 연민과 슬픔의 감정 안에 머물 수 있어 기쁘지만, 그런데 때로는 그저 온전히 웃고 싶기도 하다. 따스한 사람들의 품에 안겨 안온하게 미소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문장의 습격을 받고 ‘아, 이 사람 진짜 웃기네!’라며 깔깔대는 폭소를 상상해보게 된다. 그럴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소설은 정영문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7인의 사무라이>다.

이름하여 메타소설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진지한 고찰과 비판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하지만 친구네 집 테라스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가리는 상수리나무를 보고, 나무 아래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머리에 도토리를 얻어맞으면 “다른 것도 아닌 도토리들에 고의로 괜히 머리를 얻어맞는 건 기분 좋은 일이야”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마다 상수리나무 아래 서 있곤 했다는 말을 들으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피쉬이 웃음이 터진 다음 이 소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소설은 이런 이야기 뭉텅이들의 연속이다. 어느 것도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고, 무엇이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결론들에 다다르며, 또다시 시선과 생각에 잡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소설에 고정된 형식은 없고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휘발되지 않고 분명히 남는 것은, 이야기의 본질에 대한 고민. 그것은 결국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미가 아닐까. 그런데 가끔은(또는 대부분) 이야기에 재미가 없고 듣다가 하품이 나오거나 잠깐 졸더라도, 그것까지도 곧 나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에 듣고 싶은 것이 아닌지, 그럼 나는 인위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목과 어깨에 들어간 힘을 풀고 있잖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 말할 준비를 해본다.